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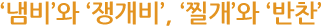
_ 설송아 / 데일리NK 기자
“쟁개비에 콩나물 찔개 있어요. 돼지고기 찔개는 식개기판에 있구요.”
한국입국 2년 차 ‘할머니 순대국 집’에서 알바를 할 때 일이다. 점심시간 손님이 많은 관계로 서빙하는 3명이 교대로 밥 먹게 되었다. 먼저 밥을 먹은 다음 나는 한국 언니에게 식사하라며 말했다.
“쟁개비에 콩나물 찔개 있어요. 돼지고기 찔개는 식개기판에 있구요.”
내가 독일말이라도 한 듯이 한국 언니의 눈동자가 커졌다. 잘못 들었나 싶어 나는 반찬그릇이 놓인 위치까지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말했다.
“저기 오봉위에 쟁개비랑 식개기판이랑 있잖아요.”
“콩나물이 어떻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못 들었어.”
내가 독일말이라도 한 듯이 한국 언니의 눈동자가 커졌다. 잘못 들었나 싶어 나는 반찬그릇이 놓인 위치까지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말했다.
“저기 오봉위에 쟁개비랑 식개기판이랑 있잖아요.”

“콩나물이 어떻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못 들었어.”
주방에서 폭소가 터졌다.
“쟁개비? 성냥개비도 아니고... 후라이팬이 뭐 뭐라구요?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말씨도 아니야...저쪽(북한)에서 왔어요?” 제각기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분명 한국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 언니들이 우스워 나도 한바탕 웃어댔다. 그러면서도 북한에서 왔다는 말은 자신 있게 하지 못했다.
“쟁개비? 성냥개비도 아니고... 후라이팬이 뭐 뭐라구요?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말씨도 아니야...저쪽(북한)에서 왔어요?” 제각기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분명 한국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 언니들이 우스워 나도 한바탕 웃어댔다. 그러면서도 북한에서 왔다는 말은 자신 있게 하지 못했다.
북한 사투리가 깊숙이 몸에 배겨 고치자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던 찰나, 제대로 한 코 먹는 셈이다. 북한 평안도 사투리 ‘쟁개비’를 한국에서는 ‘냄비’, ‘식개기판’을 ‘후라이팬’이라고 이미 일년 전에 배웠건만 수십 년 체질화 된 남북언어차이가 결국 이방인 마당을 만든 것이다.
휴식 참에 마늘을 까면서 남북사투리는 또 한 번 웃음판을 만들었다. 먼저 북한말 ‘찔개’와 한국말 ‘반찬’이었다. 평안남도에서 ‘반찬’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나 민물고기 요리만 ‘반찬’이라고 하며, 육류를 비롯한 남새요리는 통틀어 ‘찔개’라고 한다. 통일 후 서울사람들이 평안남도 주민이 차려놓은 밥상을 보면서 ‘밥반찬 맛있겠네요.’ 한다면 ‘농담을 즐기시네요.’라고 답할 것이다.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밥상음식을 반찬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평안도와 달리 요리음식은 모두 ‘반찬’이라고 한다. 하지만 평안도 지역은 찔개요리와 물고기반찬 구분이 뚜렷하다. 텃밭의 남새를 씻어 오봉 위에 놓아두는 모습은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생활풍경이다. 한국말 ‘쟁반’이 평안도 사투리 ‘오봉’이다. 오봉은 일본 사투리가 아닐까 싶다.
한국에 온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식당 알바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손님 몇 명이 테이블에 앉더니 한우 불고기를 먼저 주문했고 반찬 몇 가지를 더 첨가했다. 한동안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서빙을 하던 나에게 ‘처음처럼’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나는 제꺽 주방으로 달려가 처음에 주문한 한우 불고기를 손님들이 첨가한다고 말했다.
한우를 가지고 주문받은 테이블에 갔더니 서비스가 좋다며 ‘처음처럼’ 빨리 가져다 달라고 다시 말했다. 순간 멍~ 얼굴이 달아올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서있기만 할 때 계산대에 있던 식당사장이 달려왔다.
“무엇을 요구 하십니까?” “처음처럼 두병 주세요.”
“무엇을 요구 하십니까?” “처음처럼 두병 주세요.”
모든 것을 알아차린 사장이 ‘처음처럼’ 술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드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허망했을까...탈북자 신분을 알고 계신 사장님이 다행히 화내지 않고 ‘처음처럼’, ‘참이슬’ 등 술 이름을 가르쳐 줄 때 내가 바보 같아 솔직히 엄청 상처 받았다.
 언젠가 마트에 갔을 때 북한 말로 “종이 집개 주세요.” 했더니 끝내 알아듣지 못해 농아인 시늉을 몇 번 내보았다. 그래도 30대 마트 직원 분은 외국인 바라보듯 나를 이상하게 보기만 했다. 구매를 포기하고 사무실 와서야 ‘종이 집개’가 아니라 한국말로 ‘스테이플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언젠가 마트에 갔을 때 북한 말로 “종이 집개 주세요.” 했더니 끝내 알아듣지 못해 농아인 시늉을 몇 번 내보았다. 그래도 30대 마트 직원 분은 외국인 바라보듯 나를 이상하게 보기만 했다. 구매를 포기하고 사무실 와서야 ‘종이 집개’가 아니라 한국말로 ‘스테이플러’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 온지 8개월이 된 한국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과 벌써부터 언어차이로 소통 안 될 때가 있다. 지난 주말 아들과 백화점을 돌아보던 나는 “‘꼬깔 단복’ 이쁘다. 하나 사줄까?” “어머니 이건 ‘후드티’라고 해요.” 아들과 웃으며 쇼핑의 하루를 보냈지만 언어의 차이가 모자의 소통에도 담벽이 생기고 있음을 처음 직감했다. 10대 아들은 벌써 한국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챙겨야 될까... 북한 언어를 버리고 한국 외래어 공부를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일인지 잠시 생각했다. 세계와 단절된 북한사회 언어를 전통적인 민족 언어라고 봐야 될지, 글로벌 세계화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외래어가 발전적인 언어라고 단정할지는 남북이 모두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북 언어 차이는 지역 사투리이기 전에 또 하나의 새로운 분단문화를 생성하고 있다. 남북 문화통합의 우선인 언어의 갭 때문에 날이 갈수록 문화가 분단된다면 민족소통은 한국말 그대로 ‘핵노잼’이 아닐까 싶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 설송아 |
평안남도 출신, 2011년 한국 입국. 데일리NK기자로 북한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