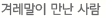_ 김수업 / 전 국어심의회 위원장

나는 철들고 반세기 넘도록 살아오는 동안 우리나라가 북녘과 손잡고 《겨레말큰사전》을 만드는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두 동강난 겨레를 다시 잇는 일의 바탕이요 알짜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갈라진 겨레를 다시 이으려는 바람을 안고 갖가지 일들을 벌였다. 정치가들이 만나 공동성명도 내고, 흩어진 가족들이 만나 눈물바다를 이루며 끌어안기도 하고, 뭍으로 바다로 하늘로 적지 않은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고, 마침내 나라책임자가 두 차례나 만나 손을 부여잡고 뜻을 모으기도 했다. 그런 일 어느 하나 값지지 않은 것이 없지만 나는 그 어느 것보다 《겨레말큰사전》 만드는 노릇이 가장 값지다고 생각한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같은 여러 계산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겨레가 반드시 하나로 다시 어우러져야 한다는 뜻을 가장 또렷하게 담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강난 겨레를 다시 잇는 일’, 이것은 누가 뭐래도 오늘날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칠천만 우리 겨레의 가장 뜨거운 바람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살다가 돌아가신 선인들이나 앞으로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살아갈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바람일 것이다. 우리 겨레는 우리가 갈라지고 싶어서 갈라진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다시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갈라놓은 것은 일본제국주의자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패권주의자들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일본제국이 우리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지 않았다면, 일본제국을 무너뜨린 미국과 소련이 일본 열도를 잘라 나눌지언정 우리 땅을 나누어 차지하려는 꿈은 꾸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일본제국도 소련도 사라지고 미국 홀로 남았는데 어째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남녘이나 북녘이나 우리가 못난 탓일 뿐이다. 그래도 《겨레말큰사전》을 함께 손잡고 만드니 못난 우리의 부끄러움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나는 언론에서 남북이 함께 《겨레말큰사전》을 만들자고 ‘사전편찬의향서’를 주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며 놀랐다. 남북의 우리말사전에 여태 오르지 못한 낱말을 모두 찾아 올리기로 했다기에 더욱 반갑고 기뻤다. 사실 나는 평생 우리말과 말꽃 가르치는 공부를 하면서 우리말사전을 펼칠 적마다 늘 속상했다. 속상한 까닭의 하나가 바로 ‘살아 있는 사람들이 날로 쓰는 입말’을 찾아 싣지는 않고, 글자로 적힌 것은 낱말도 아닌 한자까지 샅샅이 긁어모아 실어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전국국어교사모임 선생님들과 의논해 나라 곳곳에 있는 국어 선생님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사전에 오르지 못한 낱말을 찾아 모아 새로운 우리말사전을 만들어보자고 벼르고 있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런 소식을 만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남쪽 편찬위원장이셨던 홍윤표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서 곧장 남녘에서는 사전에 오르지 못한 낱말을 어떻게 찾으려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속셈으로는 전국국어교사모임 선생님들의 힘을 빌리면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답은 시도별로 사투리 전공 학자를 골라서 책임을 지워 찾는 일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굳이 어려운 일을 벌일 것 없이 《겨레말큰사전》을 뜻한 그대로 훌륭하게 만들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소문에 북녘은 전체주의 나라라 곧장 나라를 샅샅이 뒤져 사전에 오르지 못한 낱말을 있는 대로 찾아 놓고 지금 사전에 올릴 낱말을 가리는 일에 힘쓴다고 들었다. 그런데 남녘은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다. 큰 시와 도를 하나씩 책임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시간을 바쳐서 살아 있는 입말을 알뜰하게 찾아냈는지 궁금하다. 일테면 내가 어릴 적에 우리 고향 진주에서는 눈만 뜨면 다음과 같은 낱말을 주고받으며 살았으나 아직까지 어떤 우리말사전에도 오르지 못했다. “사람이라고 모두 같은 사람인 줄 아나? 사람도 다 뜨레가 있다.” “한테다 뒤죽박죽 모으지 말고 굵은 것하고 자잔한 것을 좀 뜨레를 지어서 모아라.” 하는 이름씨 ‘뜨레’, “여자들 소드래에 한번 오르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다.” “어쩌자고 그런 소드래를 만들어서 난리를 피우나 그래?” 하는 이름씨 ‘소드래’, “성태는 처갓집 찜으로 이번에 좋은 자리에 취직을 했다며?” “요새 같은 세상에 찜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하는 이름씨 ‘찜’, “대구로 이사를 간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에나가?” “영필이 그 사람 육자배기 소리 에나 잘 하데!” 하는 이름씨와 어찌씨로 두루 쓰는 ‘에나’를 비롯하여, “그렇게 구불어지고도 뼈가 멀쩡하다니 하늘이 도왔다!” 하는 움직씨 ‘구불어지다’, “잠가 놓은 자물통을 우찌 께루고 들어갔노?” 하는 움직씨 ‘께루다’, “보릿단을 여따 이리 끌빡아 버리모 우짜노?” 하는 움직씨 ‘끌빡다’, “조심해라 널쭈모 깨진다.” 하는 움직씨 ‘널쭈다’, “떨군 가오리 덕석 가오리 아이가!” 하는 움직씨 ‘떨구다’(국어사전에도 ‘떨구다’가 실렸지만 그것과는 사뭇 다른 낱말이다.)에다, ‘꿀찜하다’, ‘느럼느럼하다’, ‘뭇되다’, ‘쑥쑥하다’, ‘야삼하다’, ‘옴부랍다’, ‘칼컬하다’, ‘허축하다’ 같은 그림씨 낱말이 모두 국어사전에 오르지 못한 것들이다. 내가 아는 우리 고향 말만도 이러니 온 나라를 뒤져 찾으면 얼마나 많은 낱말이 있을까? 이들 낱말이 모두 《겨레말큰사전》에 올라 떳떳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이처럼 가슴 설레며 기다리는 《겨레말큰사전》이기에 내 마음에는 온갖 바람이 똬리를 틀고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우선, 토박이말의 속뜻을 제대로 가려서 쉽게 풀이해달라는 바람이다.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토박이말을 뒤죽박죽 쓰고 있다. 마땅히 국어사전이 올바로 가르쳐야 하지만 속뜻을 제대로 가려서 풀이해주는 사전이 없다. 보기 하나만 들어보자.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가 기대고 있는 남녘의 《표준국어대 사전》에서 ‘내’를 찾아보면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개천” 이렇고, ‘시내’를 찾아보면 “골짜기나 평지에서 흐르는 자그마한 내≒소계(小溪)” 이렇고, ‘개천’을 찾아보면 “개골창 물이 흘러 나가도록 길게 판 내≒굴강(掘江)” 이렇고, ‘실개천’을 찾아보면 “폭이 매우 좁고 작은 개천≒소류(小流)” 이렇고, ‘개골창’을 찾아보면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구거(溝渠)” 이렇고, ‘도랑’을 찾아보면 “매우 좁고 작은 개울≒물도랑ㆍ물돌ㆍ수거(水渠)” 이렇고, ‘개울’을 찾아보면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 이렇다. 내, 시내, 개천, 실개천, 개골창, 도랑, 개울이 그야말로 뒤죽박죽 얽혀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게다가 우리 어릴 적까지도 쓰던 ‘가람’은 아예 싣지도 않고, 아무 쓸모도 없는 한자말을 여럿이나 끌어다 놓았다. 주제넘지만 한 마디 하면, 바다로 들어가는 크고 많은 물은 ‘가람’이고, 가람으로 들어가는 물은 ‘내’고, 내에서도 가는 내는 ‘시내’고, 내로 들어가는 물은 ‘개천’이고, 개천에서도 가는 개천은 ‘실개천’이고, 개천으로 들어가는 물은 ‘개울’이고(‘개골창’은 개울의 사투리다), 개울로 들어가는 물은 ‘도랑’이다. 이들 가운데 개울과 도랑은 사람이 손을 써서 늘 돌보는 것이라 그밖에 것들과 다르다. 이처럼 아름다운 토박이말은 모두 ‘강’이라는 한자말에 짓밟혀 죽거나 죽어가고 있다. 또 하나, 토박이말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 하지 말라는 바람이다. 우리는 오랜 왕조 시대에 높은 사람들이 한문과 한자말을 쓰면서 잘(?) 살았고, 왕조가 무너지자 지식인들이 서양말을 쓰면서 잘(?) 살아서 ‘소젖’ 위에 ‘우유’ 있고 ‘우유’ 위에 ‘밀크’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말사전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우리네 부끄러운 역사의 찌꺼기다. 아름다운 우리 토박이말 ‘가시버시’의 깊은 속살을 알지도 못하면서 《표준국어대사전》은 “부부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 풀이해놓았다. 제발 《겨레말 큰사전》은 우리말의 알짜인 토박이말을 함부로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 하지 말기 바란다.
| 김수업 |
경북대 사범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사와 문학석사·박사를 학위 받고, 경상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대구가톨릭대 총장과 모국어교육학회장, 배달말학회장, 우리말교육현장학회장, 국어심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저서로는《배달말꽃, 갈래와 속살》,《국어교육의 바탕과 속살》,《배달말 가르치기》,《말꽃 타령》,《우리말은 서럽다》 같은 책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