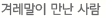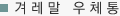


동강축제 구경도 겸해서요. 볼거리 할거리가 많은데 ‘삼굿체험’이란 게 있었어요.
“삼굿? 무슨 굿판이라도 벌어지나 보다.”
한바탕 굿구경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삼껍질을 벗기려면 땅에 구덩이를 파고 삼대를 쪄야 합니다. 거기 옥수수며 감자를 껴묻어 구워먹는 오랜 고장풍습을 재현하는 놀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굿’은 무당이 너울너울 춤추는 그 굿이 아니라 구덩이를 뜻하는 ‘굿’이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 ‘굿뱀’도 있고 ‘굿일’도 있더군요. 흙구덩이에 모여사는 뱀은 굿뱀이고 무덤 파는 일은 굿일이고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삼굿에서 구운 옥수수며 감자며 달걀을 얻어 왔어요. 먹어본 아이들은 ‘옥수수는 무르고 맛나고, 달걀 맛은 이상하다’고 했어요. 달걀은 훈제처럼 연기가 스며 평소 먹던 깔끔한 맛이 아니었던 거지요.
구멍 또는 구덩이를 뜻하는 굿이란 말이 이제 널리 쓰이지 않듯이 삼굿도 우리네 도시생활에선 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구경거리로만 남았어요. 말과 더불어 우리 삶의 익숙한 한 풍경도 사라져가는 거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말랑하던 옥수수 맛과 함께 비 머금은 삼굿에서 오르던 연기의 냄새를 기억 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삼굿? 무슨 굿판이라도 벌어지나 보다.”
한바탕 굿구경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삼껍질을 벗기려면 땅에 구덩이를 파고 삼대를 쪄야 합니다. 거기 옥수수며 감자를 껴묻어 구워먹는 오랜 고장풍습을 재현하는 놀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굿’은 무당이 너울너울 춤추는 그 굿이 아니라 구덩이를 뜻하는 ‘굿’이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 ‘굿뱀’도 있고 ‘굿일’도 있더군요. 흙구덩이에 모여사는 뱀은 굿뱀이고 무덤 파는 일은 굿일이고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삼굿에서 구운 옥수수며 감자며 달걀을 얻어 왔어요. 먹어본 아이들은 ‘옥수수는 무르고 맛나고, 달걀 맛은 이상하다’고 했어요. 달걀은 훈제처럼 연기가 스며 평소 먹던 깔끔한 맛이 아니었던 거지요.
구멍 또는 구덩이를 뜻하는 굿이란 말이 이제 널리 쓰이지 않듯이 삼굿도 우리네 도시생활에선 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구경거리로만 남았어요. 말과 더불어 우리 삶의 익숙한 한 풍경도 사라져가는 거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말랑하던 옥수수 맛과 함께 비 머금은 삼굿에서 오르던 연기의 냄새를 기억 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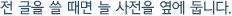 하지만 사전에서 살려 쓰는 말은 드물어요.‘말’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까닭이죠. 제 두 번째 책은 과학소설이라 상상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말을 짓는 일도 많이 필요했죠. 말을 하나 새롭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사전에서 살려 쓰는 말은 드물어요.‘말’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까닭이죠. 제 두 번째 책은 과학소설이라 상상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말을 짓는 일도 많이 필요했죠. 말을 하나 새롭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그 소설에는 역진화를 통해 탄생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이름을 짓기 위해 저는 무진 애를 썼어요. 귀에 쏙 박히면서도 신선하고 의미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이름을 짓고 싶었지요. 두꺼운 사전이며 생태도감이며 이미 사라진 동물에 대한 백과며 온갖 자료를 뒤지면서 골머리를 싸맸지만 결국 제 짐승의 이름은 ‘곰쥐’가 되었어요. 멋진 어감보다 쉬운 의미전달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지 않아도 낯선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 책이라 낱말 하나라도 쉽고 익숙하게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로서는 우리말의 이름씨들을 처음 지었을 그 옛날의 누군가들에게 감탄하고 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파리, 나비, 잠자리.
‘플라이, 버터플라이, 드래곤플라이’보다 정성스럽고, 부르기 쉽고 그 이름씨의 주인에도 잘 어우러지지 않나요? 천의무봉. 이렇게 말 짓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지 시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긴 아이들은 혀가 서투른 탓에 저도 모르게 말 짓는 이가 되지요. 제 딸은 어렸을 때 ‘크레파스’ 를 ‘크바추추’라고 불렀어요. 크바추추. 그 귀여운 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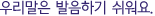 한자어를 제하면 대체로 각진 말, 치받는 말이 드물잖아요. 심지어는 외래어도 우리 땅에서 오래 묵으면 계곡을 벗어나 물가에 누운 자갈처럼 둥글어지지요.
한자어를 제하면 대체로 각진 말, 치받는 말이 드물잖아요. 심지어는 외래어도 우리 땅에서 오래 묵으면 계곡을 벗어나 물가에 누운 자갈처럼 둥글어지지요.우리말은 소박하고 거드름이 없고 명랑합니다. 그리고 감각에 충실하고요.
‘도마뱀’은 도망갈 때 천적의 눈을 호리느라 제몸의 꼬리토막을 뚝 떼내주고 ‘옛다, 이거나 먹어라.’하고 허둥지둥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뱀이지요. 토막뱀이 아니라 둥글려서 도마뱀이니 더 정겹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잘 쓰이고 있는 우리말도 있지만 사전에서나 찾을 수 있게 된 말도 많아졌습니다.
‘바람꽃’을 아세요? 큰 바람이 일어나려 할 때 먼 산에 끼는 뽀얀 기운을 바람꽃이라 부른답니다. 사실.....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먼 산이 보이지도 않고 오늘의 날씨는 텔레비전에서 알면 되니까요.
‘도사리’도 있어요. ‘밭에서 흙속의 뿌리로 겨울을 나고 이른 봄에 돋아난 풀을 뜻하는 말이지요. 우리 옛 님들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에도 이름을 주셨으니 산책로를 걸으면서 만나는 풀나무들의 이름을 거의 모르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말글은 한 존재를 다른 존재와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날실과 씨실을 엮어 베를 짜듯 우리가 모여 이룬 삶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먼훗날 우리말의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맥도날드 가게의 붙박이 의자처럼 여기나 저기나 비슷비슷하고 팍팍한 삶의 결들이 우리말을 더 거칠게하고 어둡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배미주 |
2008년 동화집 <웅녀의 시간여행>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2009년 <싱커>로 창비 청소년문학상에 당선되었다. 그밖에 공저 <천둥치던 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