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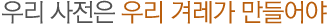
_ 정재도 / 한말글 연구회 회장

‘모욕’이 20세기 초에도 쓰였으나 ‘목욕’이라는 한자말에 밀려 옛말로 돌아가고 말았다. ‘곳’은 한자말 ‘처소’에 치이다가 일본말 ‘장소’에 눌려 반병신이 되어 있다. 우리가 애써 만든 ‘처지’도 ‘입장’이라는 일본말 그늘에서 깔딱거리고 있다. ‘가호’를 만들어 놓았는데 ‘가족·식구’라는 뜻의 한자말 ‘가구’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구실’이 제 구실을 못하고 ‘역할’이라는 일본말에 파묻혀 간다.
이러한 몰골들이 우리 사전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 겨레의 어떤 동아리는 ‘한나라’의 ‘한겨레’로서 ‘한말’과 ‘한글’을 붙들고 ‘얼 · 말 · 글’을 지켜 내려온다.
‘가물치’를 잡아먹으려고 한자말로 ‘뇌어, 대포어, 동두어, 동어, 수염, 여어(2), 예어, 오례, 오린, 익어, 정어, 현례, 화두어, 흑례, 흑어’ 들을 만들고 끌어들여 난장판을 이루고 있으나, 어떤 동아리가 한자로 ‘가무치’, ‘감을치’들까지 만들어 맞서 ‘가물치’를 살려 내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을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가지고 엮는다고 하니, 그것들을 참고로 하여 남북 사전에 대한 생각과 발전, <겨레말큰사전>에 바라는 것들을 적어 볼까.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표>로, <조선말대사전>을 <조>로 나타낸다.)
우리말 ‘당기다’의 일본말이 ‘힛파루’다. ‘引つ張る’라고 적는다. 한자말로는 ‘견인(牽引)’이다. 그것을 어찌하려고 했는지 <조>에
引張 : (다듬은 말로) 당김
引張力 : (다듬은 말로) 당김힘
이라고 올렸다. 일본말을 일본한자말로 만든 것이다. ‘다듬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당기다’로 ‘당김’, ‘당김힘’이라고 하면 그만인 것을……. 그러나 그나마 ‘당김’, ‘당김힘’이라고 하라고 했지, ‘인장’, ‘인장력’이라고 하라고는 하지 않았고, (물론, ‘引張’이라는 한자말은 없다.) 그냥 ‘당김’과 ‘당김대, 당김선, 당김 세기, ……’ 등 섞임말 16개를 만들어 그것이 <표>에도 실려 있다.
그런데, <표>에서 허깨비 ‘引張’을 만들어 그것에다가 <조>에 있는 ‘당김’의 풀이를 옮기고, 그 ‘引張’에 ‘引張强度, 引張材, 引張鐵筋’ 들을 만들어 보탰다.
<조>는 ‘引張’이라는 이상한 것을 올려 놓았으나 쓰지 않고 우리말 ‘당김’을 내세웠는데, <표>는 거꾸로 없는 ‘引張’을 만들어서 한자말이라고 내세워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支拂’의 ‘拂’에는 먼지를 ‘떤다’라는 뜻은 있어도, 돈을 ‘치른다’라는 뜻은 없다. 그런데 일본말로는 먼지를 ‘떨다’도 ‘하라우’, 돈을 ‘치르다’도 ‘하라우’다. 그러므로 소리가 같아서 ‘拂’을 ‘치르다’에도 쓴다. 우리는 ‘떨다’를 ‘치르다’라고 하지 않는다. ‘拂’을 ‘치르다’에는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支拂’을 쓰면 잘못이다. 중국에서도 ‘치르다’를 ‘즈푸(支付)’라 하고, 소리가 같아도 ‘즈푸(支拂)’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말 ‘支拂’을 1980년대에 법제처에서 ‘지급(支給)’으로 다듬어서 지금 그렇게들 쓰고 있다. 그런데 <표>는 ‘支拂’도 <조>에 있는 그대로 쓰고 있으며, 더 확대하여, 그 섞임말도 여태 있던 ‘지불거절증서’, ‘지불보증, 지불수형, ……’들 13개, 새로 만든 ‘지불거절, 지불계획, 지불금, 지불기, ……’들 19개를 써도 되는 것처럼 다 싣고 있다.
사전이나 말을 이렇게까지 망친다면 나라와 겨레의 체면과 문화는 어찌 되는 것인가.
우리말이 있는 것은 한자말로 바꾸지 말고, 우리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한자로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표>의 다음 한자말은 우리에게는 없어도 되므로 지워 없애야 한다.
牛角(쇠뿔), 羽角(뿔털), 雨脚(빗발), 牛角灸(쇠뿔뜸), 羽幹(깃대),
雨季(장마철), 牛骨(쇠뼈), 牛骨油(쇠뼈기름), 牛藿(소미역),
羽冠(도가머리), 禹韭(겨우살이 풀), 右弓(오른살), 尤極(더욱),
尤隙(말다툼), 牛筋(쇠심), 羽根(깃뿌리), 藕根(연뿌리),
牛筋木(박달나무), 牛筋菜(심나물), 雨期(장마철), 偶鰭(짝지느머리)
(‘우가’와 ‘우기’ 사이에 있는 말들이다.)
| 정재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