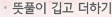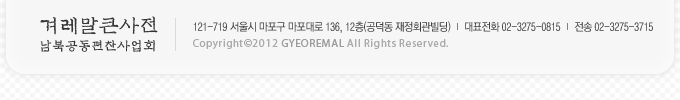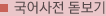

_ 조재수 /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 위원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정독을 하며, 우리의 독서 자료는 얼마나 정확할까? 세상의 책들 가운데 정확성을 제일로 치자면 먼저 사전을 꼽을 것이다. 정확해야 할 사전의 운명은 사전에 다룰 말 자료의 정확성과 편찬인의 정확한 통찰력에 달렸다. 자료의 말과 문장이 정확해야 하고, 말의 자료를 검토하여 적용하는 편찬인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정확해야 한다. 국어사전은 바른 국어 자료의 말과 문장을 실을 수 있어야 바른 국어사전이 된다.
사전 편찬을 위한 말자료(‘말뭉치’)에는 소설 등의 문예작품이 대종을 이룬다. 문예작품은 제 겨레의 삶과 생각의 자취를 많이 담고 있는 언어 자료이기에 그렇다. 사전 편찬인은 많은 어휘와 문장의 숲을 돌아다닌다(섭렵한다). 낱낱의 말과 그 말을 부려 쓴 문장들을 눈여겨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러 곳에서 구축된 국어 말뭉치는 1억 어절이 넘는 거대한 분량이다. 이 가운데는 같은 작품이 판본에 따라 어휘 형태, 표현 등에 차이 나는 것들이 있다. 때로는 아주 엉뚱하게 다른 경우도 만나게 된다.
한 작가의 글을 두고 그 원본 원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출판사 어느 선집의 글이 바르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초간본이라도 볼 수 있을 때는 큰 도움이 된다. 같은 내용의 글이 어휘나 표현에 차이가 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철자나 띄어쓰기, 문장부호도 문제지만 심각한 오류는 어휘나 글마디의 변형에 있다. 철자나 띄어쓰기를 지금의 기준으로 고치는 것쯤은 양해 사항으로 통한다. 어휘의 오류는 우선 조판과 교정의 잘못에서 나올 수 있고, 심하게는 편집자들이 방언(사투리)이라 하여 표준어로 바꾸는 일 등에서 생긴다. 글마디의 변형은 흔히 윤문이라 하여 표현을 다듬거나 고치는 데에서 빚어진다. 섣불리 고칠 일이 아니다. 글쓴이의 생각도 중요하고 글쓴이가 부려쓴 언어도 그대로가 중요하다. 특히, 사전 편찬 자료로는 글쓴이의 일차 어휘와 문장이 중요하다. 사전 편찬인은 함부로 말을 깎거나 줄여서는 안 되며 있는 그대로의 언어와 표현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생생한 언어의 자취가 정확하게 보존될 수 있다.
이효석(1907~1942)이 ‘모밀꽃’, ‘모밀밭’이라 쓴 것을 ‘메밀꽃’, ‘메밀밭’으로 고쳐버리면 이는 이효석의 어휘가 아니다. 또 달빛 아래 피기 시작한 너른 모밀밭의 모밀꽃을 두고 “꽃이 소곰을 뿌린 듯이 흠읏한 달빛에 숨이 막켜 하얗었다”고 했다. <이효석: 모밀꽃 필 무렵>(조광. 1936. 10.) 이를 그 뒤에 나온 출판사의 판본들에는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라고 고쳐버렸다. <이효석: 메밀꽃/모밀꽃 필 무렵>(어문각. 1994, 1936)/(동아출판사. 1995, 1936) 모밀꽃이 달빛을 받아 “숨이 막혀 하얗었다(하얬다)”는 하얀 소금을 뿌린 듯 한 꽃의 흰빛을 그린(묘사한) 것인데, “숨이 막힐 지경이다”로 끝맺으면 그 흰빛은 없어지고 숨 막힐 듯 한 상황만 그린 것이 된다. 왜 초간본과 달리 이런 수정이 필요했을까? 초간본이 작가의 원본 또는 그에 가까운 글이라면 이런 수정은 작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어사전에 ‘메밀꽃’은 있으나 ‘모밀꽃’은 사라졌고, 컴퓨터로 ‘모밀꽃’을 치면 자동 교정기가 번번이 ‘메밀꽃’으로 고쳐버린다. 누가 이런 교정기를 만들게 했는지? 이효석의 ‘모밀꽃’을 되찾아 주는 일, 우리말 하나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문예작품의 말과 글, 어떤 모습으로 간직되고 전해지는지 국어사전에서 이따금 꺼내보기로 한다.
북에서 낸 <조선말 사전>(1961년)에 ‘데시근하다’를 처음 올렸다(아래).
데시근하다 [형] (언행이) 씨가 먹지 않고 미적지근하다. ∥ 데시근한 소리. 행동이 데시근하다.
그런데, 북의 <조선말대사전>(1992년)은 ‘데시근하다’ 이외 ‘다시근하다’, ‘되시근하다’를 더 올렸다(아래).
[같은] 데식다②.
다시근하다 [형] 약간 뜨끔하다. | 한 몽둥이에는 어깨마디를 얻어맞았지만 다시근하게도 여
기지 않았다. <림꺽정 1>
되시근하다 [형] (대하는 태도가) 별로 대단스레 여기는 맛이 없고 뜨뜻미지근하다. | 꺽정이의
말에 다른 두령들은 모두 회심하려 하는데 곽오주 혼자만은 되시근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무뚝뚝한 말소리로 지껄였다. <림꺽정 3>
역사 소설 <임꺽정(林巨正)>은 홍명희(1888~1968)가 1928년 11월 21일부터 1939년 3월 11일까지 〈조선일보〉에 발표하고, 이어 1940년 〈조광〉 10월호에도 발표했으나 미완으로 끝난 작품으로 전해진다. 오늘날 손쉽게 볼 수 있는 남녘 판본으로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1991년에 낸 <林巨正>이다. 초간본으로는 조선일보(1939년)판의 일부(?)를 검색해 볼 수 있다. 북에서는 광복 직후에 나온 것(을유문화사, 1948년 판?)을 1950년대에 철자만 일부 고쳐 낸 것이 있고, 1980년대에 미완의 부분을 홍명희의 손자 홍석중이 상상하여 쓴 것이 있다 한다 <김재용 교수>.
소설의 주인공 ‘임꺽정’은 지은이가 조선일보에 연재할 때 제목을 한자로 “林巨正傳”이라 쓰고 본문에는
 이라 했는데 이것이 철자법 차이로 남녘에는 ‘임꺽정’, 북에서는 ‘림꺽정’이 되었다. 한글로 제목을 붙인다면 ‘임거정전, 림거정전’이 아니라, ‘임꺽정전, 림꺽정전’이 바를 것이다. 소설 제목을 한자로 <林巨正>이라 쓰면 본 이름 ‘꺽정’이가 ‘거정’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라 했는데 이것이 철자법 차이로 남녘에는 ‘임꺽정’, 북에서는 ‘림꺽정’이 되었다. 한글로 제목을 붙인다면 ‘임거정전, 림거정전’이 아니라, ‘임꺽정전, 림꺽정전’이 바를 것이다. 소설 제목을 한자로 <林巨正>이라 쓰면 본 이름 ‘꺽정’이가 ‘거정’으로 착각하게 된다.
*한 몽둥이에는 어깨바디를 얻어맞았으나 데시근하게도 여기지 않고 <홍명희: 임꺽정>(사계절 출판사. 1991년)
*한 몽둥이에는 억개바듸를 어더 마젓스나 듸시근하게도 여기지 안코 <홍명희: 임꺽정>(조선일보사. 1939년) |주| 억개바듸(어깨바디)->어깨부들기: 어깨의 뿌리, 또는 그 언저리.
*다른 사람 같으면 그만 앞으로 꼬꾸라질 것인데 총각은 데시근하게도 여기지 않고 꿋꿋이 서 있었다. <홍명희: 임꺽정>(사계절 출판사. 1991년)
*다른 사람 가트면 고만 아프로 고끄라질 것인데 총각은 듸식은 하게도 여기지 안코 꿋꿋이 서잇다 <홍명희: 임꺽정>(조선일보사. 1939년)
*꺽정이의 말에 다른 두령들은 모두 회심하려 하는데 곽오주 혼자만은 되시근하게 여기지도 않으며…무뚝뚝한 말소리로 지껄였다. <림꺽정 3>(북)
*꺽정이의 서글픈 말끝에 다른 두령들은 모두 회심하여 하는데 곽오주 혼자 데시근도 않게 여기며 “……” 하고 무뚝뚝한 말소리로 지껄이었다. <홍명희: 임꺽정>(사계절 출판사. 1991년)
*꺽정이의 서글픈 말끄테 다른 두령들은 모두 회심하야 하는데 곽오주 혼자 듸식은 도안케녀기며 “……” 하고 무뚝뚝한 말소리로 지꺼리엇다. <홍명희: 임꺽정>(조선일보사. 1939년)
이 밖의 작품들에서도, ‘데시근하다’와 ‘되시근하다’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자식들이 펀치 먹인 창문들을 어느새 다 고쳐놓았네.” (중략) “아무튼 걸작들이야.” “한 주일 정학쯤은 데시근하게두 안 여길걸.” <김학철: 격정시대>(연변. 1998)
*“… 이분은 우리 경찰의 허가를 받은 사냥군인데…” 수석 놈의 이렇듯 데시근한 태도에 약이 바싹 오른 야마다가 이때를 참지 못해 더 한층 본색을 드러냈다. <김종원: 아름다운 밤>(북. 1978)
*선흥이는 묶인 팔과 등판에 은근히 힘을 주어 보았다. 되시근하기는 하였으나 일시에 힘을 주면 끊길 듯도 하였다. <황석영: 장길산(3-344)>(현암사. 1976)
되시근하다 [형] -> 데시근하다.
듸시근하다/디시근하다 [형] -> 데시근하다.
데시근하다 (데-시근-하-다) [형]
① (뼈마디 같은 것이) 약간 시근하거나 약간 뜨끔하다.
*막봉이가 한 몽둥이는 첫번에 비키면서 곧 붙잡고 한 몽둥이에는 억개바듸(어깨바디)를 얻어맞았으나 듸시근하게도(데시근하게도) 여기지 않고 <홍명희: 임꺽정>(조선일보. 1939. 일부, 현대 철자로 고쳐 인용함). |주| ‘어깨바디’는 ‘어깨부들기’와 같은 말. 어깨의 뿌리, 또는 그 언저리.
*도적이 … 총각의 골통을 칼로 쳤다. 다른 사람 같으면 고만 앞으로 고끄라질(꼬꾸라질) 것인데 총각은 듸식은 하게도(데시근하게도) 여기지 않고 꿋꿋이 서있다 <홍명희: 임꺽정>(조선일보. 1939. 일부, 현대 철자로 고쳐 인용함)
*선흥이는 묶인 팔과 등판에 은근히 힘을 주어보았다. 되시근하기는(데시근하기는) 하였으나 일시에 힘을 주면 끊길 듯도 하였다. <황석영: 장길산>
*가령 부용이와 같이 약한 사람이 아무리 급하게 가다가 가슴을 들박았다 할지라도 소등때기에 모기지 데시근하게도 여기지 않을 녀석이였다(녀석이었다). <김용식: 설랑자>(연변. 1984)
*데시근한 소리. *행동이 데시근하다. <조선말 사전>(북. 1961)
*상도는 그런 일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이순의 일이라 미신일망정 데시근하게 들을 수 없었다. <한설야: 탑> *창세도 자기가 그녀에게서 감정이 점점 데시근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윤림호: 물빛의 긴 려로>(연변. 2001)
*꺽정이의 서글픈 말끝에 다른 두령들은 모두 회심하야 하는데 곽오주 혼자 듸식은도(데시근도) 않게 여기며 “……” 하고 무뚝뚝한 말소리로 지껄이었다. <홍명희: 임꺽정>(조선일보. 1939. 일부, 현대 철자로 고쳐 인용함)
*그 자식들이 펀치 먹인 창문들을 어느새 다 고쳐놓았네.” (중략) “아무튼 걸작들이야.” “한 주일 정학쯤은 데시근하게두 안 여길걸.” <김학철: 격정시대>(연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