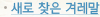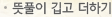_ 김재용 /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자어는 중국의 한자를 한국과 일본이 받아들인 이후 각 나라에서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공통의 어휘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각 지역의 독특한 어휘들이 생기기 시작하여 상이한 면모를 갖게 되었다.
아편 전쟁 이후 서양의 새로운 문물이 등장하면서 가장 앞서서 수용하였던 일본이 자기만의 독특한 한자어를 만들었고 이어서 중국과 한국이 이를 참고하면서 자기만의 한자어를 만들기도 하였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양이 발명한 train을 일본이 기차라는 새로운 한자어로 번역하여 만들어 낸 반면, 중국은 다른 한자어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한자어와 중국의 한자어 사이에서 혼란을 겪던 한국에서는 일본이 번역하여 만든 한자어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 현재 남북에서는 기차를 가장 널리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현재 중국에서는 기차를 train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car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자어는 현대 이후 한중일 모두에서 독특한 양상으로 정착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바로 일본의 강점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진 한자어의 혼란상이다.
일본인들이 조선을 강점한 이후 일본인 관료들은 조선을 자신들의 취향대로 통치하기 위하여 열심히 조선어를 공부하였다. 조선어를 잘 하는 관료들에게 승진의 혜택을 줄 정도로 조선어 강습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들이 조선어를 공부하면서 당황했던 것 중의 하나는 같은 사물을 놓고 다른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들은 '가족'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선인들은 '식구'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동일한 사물에 대해 상이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과 조선의 한자어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가족과 식구를 둘 다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가족이란 어휘를 더 자주 사용하는 현실을 보면 일제 강점 이후의 식민지적 현실이 한자어 어휘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이 너무 굳어져서 어휘를 연구하는 학자들마저도 알지 못할 정도이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는 어휘에 남다른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알아차릴 정도로 정착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채만식 '탁류'의 다음 장면이다.
아편 전쟁 이후 서양의 새로운 문물이 등장하면서 가장 앞서서 수용하였던 일본이 자기만의 독특한 한자어를 만들었고 이어서 중국과 한국이 이를 참고하면서 자기만의 한자어를 만들기도 하였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양이 발명한 train을 일본이 기차라는 새로운 한자어로 번역하여 만들어 낸 반면, 중국은 다른 한자어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한자어와 중국의 한자어 사이에서 혼란을 겪던 한국에서는 일본이 번역하여 만든 한자어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 현재 남북에서는 기차를 가장 널리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현재 중국에서는 기차를 train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car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자어는 현대 이후 한중일 모두에서 독특한 양상으로 정착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바로 일본의 강점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진 한자어의 혼란상이다.
일본인들이 조선을 강점한 이후 일본인 관료들은 조선을 자신들의 취향대로 통치하기 위하여 열심히 조선어를 공부하였다. 조선어를 잘 하는 관료들에게 승진의 혜택을 줄 정도로 조선어 강습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들이 조선어를 공부하면서 당황했던 것 중의 하나는 같은 사물을 놓고 다른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들은 '가족'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선인들은 '식구'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동일한 사물에 대해 상이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과 조선의 한자어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가족과 식구를 둘 다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가족이란 어휘를 더 자주 사용하는 현실을 보면 일제 강점 이후의 식민지적 현실이 한자어 어휘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이 너무 굳어져서 어휘를 연구하는 학자들마저도 알지 못할 정도이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는 어휘에 남다른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알아차릴 정도로 정착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채만식 '탁류'의 다음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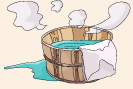 차가 대전역에 당도하자 초봉이를 앞세우고 플랫폼으로 내려서던 제호는 명승고적을 안내하는 간판에서 유성온천이라는 제목이 선뜻 눈에 띄었다.
차가 대전역에 당도하자 초봉이를 앞세우고 플랫폼으로 내려서던 제호는 명승고적을 안내하는 간판에서 유성온천이라는 제목이 선뜻 눈에 띄었다.‘유성온천?....온천?’
제호는 내숭스럽게 싱긋 웃으면서, 간판을 보던 눈으로 초봉이의 뒷맵시를 훑는다. 비로소 그는 제 야심을 의식적으로 행동에 옮겨볼 생각이 나던 것이다. 오지 않으면 아무렇게라도 오래잖아 만들기라도 할 박제호지만 우연히 그에의 찬스는 빨리 왔고 겸하여 좋았을 따름이다.
“초봉이, 온정 더러 해봤나?”
쇠뿔은 단김에 뽑으라 했으니 인제는 시간 문제라 하겠지만 시방부터는 옳게 남의 계집을 꾀는 수작이거니 생각하면 일찍이 여염집 계집한테는 못해 보던 짓이라 노상 뒤가 돌려다뵈지 않지도 않았다.
초봉이는 마침 가드 밑을 지나면서 전에 서울로 수학여행을 갈 제 이것을 보고 진기하게 여기던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한눈을 파느라고 제호가 재우쳐 물을 때서야 겨우 알아들었다.
“온정이요? 온천?...”
초봉이는 되묻고서 고개를 가로 흔든다.
“....못 가봤어요.”
박제호가 초봉이를 꼬드겨 유성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수작을 하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것은 온정과 온천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유성온천이라고 적혀 있는 안내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총독부 관할하의 대부분의 행정적 방면에서는 일본식 한자어인 온천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박제호나 초봉이의 눈에 온천이라는 한자어는 여전히 매우 낯설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온정이라는 한자어이다. 온천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던 박제호가 이 안내간판의 온천이란 어휘를 낯설게 여기면서 초봉이에게 온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초봉이 역시 온천보다는 온정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작가 채만식은 이 대목에서 온천과 온정이란 말의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일본식 한자어와 한국어 한자어가 충돌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식민지의 현실을 무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인들이 식민지를 하면서 만든 일본식 한자어와 한국의 한자어의 대차대조표에도 온천과 온정이 대조되어 적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하다. 그런데 현재 남북에서는 온정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모두 온천으로 사용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을 하려면 꼭 통과해야 하는 온정리라는 마을 이름에서 겨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온천 대신에 온정이란 말을 지금 살려 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말의 어휘를 새롭게 찾고 발굴하고 있는 겨레말 사전에서는 이러한 어휘의 역사를 밝혀 놓으면 좋겠다.
작가 채만식은 이 대목에서 온천과 온정이란 말의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일본식 한자어와 한국어 한자어가 충돌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식민지의 현실을 무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인들이 식민지를 하면서 만든 일본식 한자어와 한국의 한자어의 대차대조표에도 온천과 온정이 대조되어 적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하다. 그런데 현재 남북에서는 온정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모두 온천으로 사용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을 하려면 꼭 통과해야 하는 온정리라는 마을 이름에서 겨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온천 대신에 온정이란 말을 지금 살려 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말의 어휘를 새롭게 찾고 발굴하고 있는 겨레말 사전에서는 이러한 어휘의 역사를 밝혀 놓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