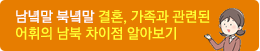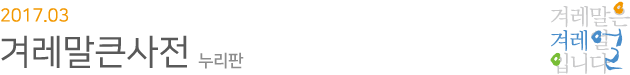


_ 이대성 / 국립국어원
표준어 ‘널따랗다’에 대응하는 문화어는 ‘넓다랗다’이다. ‘널빤지’를 북에서는 ‘널판지’라 한다. ‘줍다’에 대응하는 북녘말은 ‘줏다’이다. 이처럼 남북의 규범어가 서로 다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알아볼까 한다.
‘높다랗다, 짤따랗다’ 등에 쓰인 ‘-다랗다/-따랗다’는 ‘그 정도가 꽤 뚜렷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그런데 이 접미사를 적는 방법에서 남북이 차이가 있다. 남에서는 어간의 받침이 본래 ‘ㄼ’인 경우에는 ‘-따랗다’를 쓰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다랗다’를 쓴다.1)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는 경우에는 ‘굵다랗다(굵-+-다랗다)’처럼 용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널따랗다(넓-+-따랗다)’처럼 소리대로 적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쑥하다’도 ‘맑다’와 관련된 말이지만 겹받침의 끝소리인 ‘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맑숙하다’로 적지 않고 ‘말쑥하다’로 적는 것이다. 반면에, 북에서는 ‘-다랗-’만 쓴다. ‘굵다랗다’로 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널따랗다’도 ‘넓다랗다’로 쓴다. 남에 비해서 북은 형태를 밝혀 적는 원칙을 좀더 엄격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더 파고들어가 보면, ‘널따랗다’(남)와 ‘넓다랗다’(북)로 표기가 갈라지게 된 근본 원인은 남북의 소리가 다르다는 점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넓다’의 남측 발음은 [널따]이고, 북측 발음은 [넙따]이다. 이 차이는 ‘-다랗-’가 붙은 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남에서는 [널따라타]로 소리나지만 북에서는 [넙따라타]로 소리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북에서는 도저히 ‘널따랗다’와 같은 표기가 나올 수 없게 된 것이다. 북의 관점에서는 [넙따라타]로 소리나는 말을 ‘널따랗다’로 적는 것은 형태를 밝혀 적는 것도, 소리대로 적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재밌는 것은 ‘넓적하다/넙적하다, 넓죽하다/넙죽하다’의 경우에는 양상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때는 ‘넓적하다, 넓죽하다’처럼 어간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남의 규범이고, ‘넙적하다, 넙죽하다’처럼 소리대로 적는 것이 북의 규범이다.
운동장처럼 넓다랗고 펑퍼짐한 더기우에 뛰여오른 아이들은 발을 구르며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아버지가 섰던 자리, 북측 소설)
무엇에 얻어맞았는지 코마루가 넙적하게 주저앉아버린 덕대같이 생긴 사나이가 신음소리처럼 울부짖었다.(두만강지구, 북측 소설)
무엇에 얻어맞았는지 코마루가 넙적하게 주저앉아버린 덕대같이 생긴 사나이가 신음소리처럼 울부짖었다.(두만강지구, 북측 소설)
가느다랗다’(가늘-+-다랗다), ‘잗다랗다(잘-+-다랗다)’처럼 어간의 받침이 ‘ㄹ’로 끝나는 말이 ‘-다랗-’와 결합하게 되면 ‘ㄹ’이 탈락하거나 ‘ㄷ’으로 변한다.2) 북도 그러하다. 그런데 북은 ‘길다랗다’와 ‘잘다랗다’도 함께 인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 표준국어대사전 | 조선말대사전 | |
|---|---|---|
| 잗다랗다 | 꽤 잘다 | 보기에 무던히 잘다 |
| 잘다랗다 | ‘잗다랗다’의 잘못 | 무던히 잘다 |
영희는 잘다란 자갈들이 고르롭게 깔려있는 교사뒤로 교장을 향해 급히 걸음을 옮겼다.(작별, 북한 소설)
깨알같이 잗다란 글씨로 박아쓰다.≪조선말대사전≫
깨알같이 잗다란 글씨로 박아쓰다.≪조선말대사전≫
이와 같이 남에서는 한 가지 표기만을 규범으로 삼은 경우가 많고, 북에서는 복수 표기를 인정하고 미세한 말맛의 차이를 보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에서는 ‘커다랗다’만 표준어인데 북에서는 ‘크다랗다’도 문화어이다. 남에서는 ‘길쭉하다’만 표준어지만, 북에서는 ‘길죽하다, 길쭉하다, 낄쭉하다’ 모두 문화어이다.
‘건너다’의 경우에도, 남에서는 ‘건너다’만 표준어이지만 북에서는 ‘건느다’도 인정한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건느다’를 기본 올림말로 삼고 있다. 북에서는 ‘건너다’보다 ‘건느다’를 더 많이 쓴다는 뜻이다.
건느다 (건느니, 건너) 「동」(자.타) ① 어떤곳을 사이에 두고 그것을 거치거나 넘어서 맞은편으로 가거나 오다. ∥ 대양을 건느는 배. (중략) ③ (무엇을 거쳐서) 전하여지다. | 여러 사람의 입을 건느는 사이에 말은 자꾸만 보태여지고 엄청난데까지 이르렀다. (=)건너다. (이하 생략) ≪조선말대사전≫
흔히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서라].”라고 하지만 ‘[주워라]’가 맞다. 기본형이 ‘줍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남측에서만 적용되는 어법이다. ≪조선말대사전≫에는 이런 뜻의 ‘줍다’는 실리지도 않았다. 문화어로 인정되는 형태는 ‘줏다’이기 때문이다.3) 그리고 이때 ‘줏다’는 시옷 불규칙 용언이다.4) ‘줏다’가 어미 ‘-어라’를 만나면 ‘줏어라[주서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라’가 되고, 어미 ‘-은’을 만나면 ‘줏은[주슨]’이 아니라 ‘주은’이 된다는 뜻이다. 남에서는 비록 비표준어이지만 흔히 ‘[주서라], [주슨]’으로 발음하고 있다. 결국 남의 ‘줍다’와 ‘줏다’, 북의 ‘줏다’ 이 세 가지의 쓰임새가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다.
줏다 (주으니, 주어) [동](타) ① (바닥에 떨어지거나 흩어져있는것을) 집거나 집어서 들다. | 아영생들은 바다에 나가 조개를 줏기도 하고 굴을 따기도 했다. ② (남이 버리거나 잃은 물건을) 얻거나 집다. | 운동장에 떨어진 칼을 주어 선생님에게 바쳤다. (이하 생략) ≪조선말대사전≫
- 1)
- ‘참따랗다(=딴생각 없이 아주 진실되고 올바르다)’는 예외다. 북에서는 ‘참다랗다’로 쓴다.
- 2)
- '걸다랗다(=다른 물질과 섞인 액체가 물기가 적어 된 듯하다)’는 예외다.
- 3)
- '줏다’는 ‘줍다’의 옛말이다. 북에서는 옛말 형태 그대로 ‘줏다’를 쓰고 있는 셈이다.
*옛말 ‘줏다’ 용례: 鹿母夫人이 를
를  뒷 東山애 五百 塔
뒷 東山애 五百 塔 이로고.≪석보상절≫
이로고.≪석보상절≫ - 4)
- ‘벗고, 벗는, 벗은, 벗어’에서 보듯이 ‘벗다’는 어떤 어미를 만나더라도 어간의 형태가 유지된다. 이처럼 용언의 어간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짓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지은, 지어, 지으니’와 같이 어간 끝음절의 받침 ‘ㅅ’이 탈락한다. 이런 용언을 ‘시옷불규칙용언’이라 한다.
| 이대성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현재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