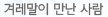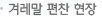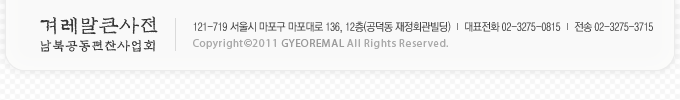_ 이근열 /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강의교수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 타 지역에 가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말씨와 음식이다.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부산에 와서 느끼는 역동적 억양과 짜고 강렬한 음식 맛은 충격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부산사람이 쓰는 거친 억양은 좌뇌에 거침없이 충격을 가하여 상대에게 전투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키고, ‘-소’로 끝나는 등급이 구분이 되지 않는 말끝은 버릇없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포장 없이 건네는 선물처럼 불쑥불쑥 들이대는 언어는 난처함의 연속이다. 고슴도치의 거리가 무시되어 언제든지 말로 아프게 찌른다.
음식은 더 충격적이다. 먹장어를 산 채로 고추장과 양파에 버무려 불판에 올려놓아 꿈틀대며 익어가는 모습은 징그럽고, 돼지뼈를 고아 국물을 만들고 기름이 둥둥 뜨는 돼지고기를 썰어 넣은 국밥은 돼지 냄새가 날 것만 같아 두렵다. 또한 메밀이 아닌 밀가루로 면을 뽑아 찬 육수에 말아 밀면이라고 내 놓고 있는 것도 이상야릇하다.
그들은 모두 부산에 사는 사람이 대부분 해운대나 광안리에 살고 있으며, 매일 맛있는 회를 먹고 여름에는 항상 해운대 바닷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즐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말을 노력에만 관심을 두는 우리들의 눈은 틀린 것일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영감이 1%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천재가 될 수 없다는 에디슨의 눈에는, 보통 사람과 천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부산은 변방의 항구도시만이 아니다. 근대사의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다.
예전에 왜관을 열어 일본인의 거주 지역을 만들어 일본상인을 수용한 곳이고, 해방의 기쁨이 광복동에 남아 있는 곳이며, 6.25의 피난 시절 임시 정부까지 이곳에 옮겨온 곳이다. 산업화의 열풍에 따라 신발 공장과 섬유 공장, 조선 공장이 설립되고 경상, 전라, 강원의 여러 지역의 일꾼들이 모여든 곳이다.
부산의 음식은 부산 역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마다 그 세찬 비바람과 그것을 이겨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꼼장어’는 먹장어의 껍질을 벗겨 고추장 양념에다 버무려 불판에 구워먹는 음식이다. 꼼장어는 음식이름이자 생선이름이다. 꼼장어는 껍질이 질기면서도 부드러워 가죽으로 쓸모가 있었다. 일제 시대에 꼼장어 껍질을 벗겨 일본 나막신의 끈과 모자의 테를 만들었다.
일본 사람들이 껍질만 귀하게 여기고, 꼼장어는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배고픈 부두 노동자들이 껍질 벗긴 꼼장어를 불에 구워 먹기 시작했고, 남은 껍질은 삶아서 묵을 만들어 먹은 것이 ‘꼼장어묵’이다. 피난 이후엔 막막한 살길을 억세게 개척한 자갈치 아지매들로 인해 고추장에 버무린 꼼장어 구이가 만들어 지고 오도독 씹히는 식감과 단백한 맛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꼼장어의 꿈틀거림은 척박한 피난지에서 살아온 자갈치 아지매의 힘든 삶의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돼지 국밥도 피난지의 산물이다. 쇠고기가 귀한 곳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돼지를 설렁탕처럼 끓인 것인데, 돼지뼈를 푹 고아 ‘진땡[진탕]’을 만들고 거기에다 돼지 머릿고기를 넣고 돼지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정구지[부추]’와 양념장과 ‘새비젓[새우젓]’을 넣었다. 돼지국밥은 바쁜 피난 시절 주린 허기를 채워준 지혜로운 대안이었다. 이러한 대안은 ‘밀면[밀가루로 만든 면]’으로 옮겨진다. ‘밀면’은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온 이북 사람들의 향수가 담겨있다. 구호품으로 받은 밀가루를 메밀가루처럼 생각하고 ‘매매[매우]’ 치대며 향수의 눈물을 섞고, 밀가루 내미[냄새]를 없애기 위해 맵고 강한 양념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다. 육수를 부어 평양식으로 밀면을 만들고 물없이 비벼서 함흥식으로 비빔밀면을 만들어 먹었다. 돼지국밥과 밀면은 결핍을 지혜로 창출한 음식이었다.
부산말도 부산 음식처럼 억센 바닷 바람과 일제 시대와 피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3단으로 나타나는 높낮이는 첫소리가 강하게 들리고 끊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투박하게 들리는 대신, 선명한 전달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높낮이의 효과는 모음을 단순화하고 음절단위의 발음법으로 나타나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한다. 말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들리게 하려는 의식은 물음법에도 나타난다. ‘-가/나/고/노’와 같이 물음의 표지를 확실히 드러내어 억양으로만 드러내는 다른 지역의 말보다 전달효과가 높다. 또한 ‘-소’로 끝나는 반말도 다양한 부류가 섞인 지역에서는 서로가 낯을 붉히지 않을 적절한 평칭이었기에 다른 지역보다도 부산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고, 투박함을 없애기 위해 ‘-예’를 붙여 부드러움을 더할 수 있었다. 나름대로의 강함 속에 숨겨둔 부드러움이 있었던 것이다. 타향 사람들이 많았던 부산은 서로를 엮어 가기 위한 친밀한 전략은 ‘아재’나 ‘아지매’라는 친족어로 서로를 부르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넓은 바다를 헤쳐 나가는 어울림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간당, 카배추, 양배차[양배추]로 엮어지는 한자어와 일본말, 우리말의 모자이크처럼 부산말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지방말은 피난의 아픔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부산말 ‘이쁘다’와 ‘새첩다’는 그 기능이 다르다. ‘이쁘다’는 사람의 얼굴이 아름답게 생겼다는 의미로 쓰지만 ‘새첩다’는 사물의 모양이 작거나 색깔이 아름다워서 사물이 귀여울 때 쓰는 말이다. 또한 ‘국자’와 ‘쪽(자)’는 지시물이 다르다. ‘쪽자’는 ‘반쪽’이나 ‘쪽발이’에서 보듯 ‘작다, 반’이란 뜻의 ‘쪽’을 어원으로 하며, 작은 국자를 의미한다. ‘달고나’를 ‘쪽자’로 부르는데, 원래 ‘쪽자’는 국자로는 만들어 먹지 않았다. 부산 사람들은 ‘어묵’과 ‘오뎅’이 다른 식품임을 안다.
결국 그 지방의 말은 지방 사람들의 정서와 역사의 나이테인 셈이다. 역사 속에 옹이진 나이테를 보면서 그 속에 녹아 있는 그들의 삶을 자신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태도는 아직도 우리에게 그들을 이해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간자장에 달걀 플라이를 얹어 주는 부산 사람들의 인간미를 세상 물정 모르는 장사꾼처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처럼.

| 이근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