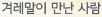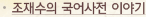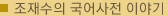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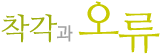
_ 조재수 /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위원
국어사전에도 착각과 오류의 자취를 볼 수 있다. 사전 속의 오류는 어휘의 표기, 뜻풀이, 인용 예문 등에 드러나는 잘못이다. 편찬자의 부주의와 그릇된 판단, 또 편찬 자료의 부실과 안이한 답습 등으로 빚어지는 실수라고 본다. 문제는 이런 잘못이 고쳐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 온다는 사실이다. 국어사전에는 어떤 착각과 오류들이 있었을까? 사전 속의 착각과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바른 국어 지식을 갖춘 밝은 눈이 필요하다. 특히 사전 편찬인의 밝은 눈이 필요하다.
바른 생각, 바른 지식을 위해 착각과 오류는 언제든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다. 여기, 지난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류들을 찾아 모은 책에서 오류에 대한 자각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명언 몇 마디를 소개하고, 우리 사전 속의 착각과 오류의 자취를 살펴보기로 한다.
진리의 강물은 오류의 운하를 통해 흐른다. <타골>
모든 사람은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바보만이 그 착각을 고수한다. <키케로>
오래된 오류는 새로운 진리보다 더 많은 친구를 가진다. <독일 속담>
지혜로운 이들은 오류를 통해 진리에 이르지만 바보들은 오류에 머문다. <프리드리히 뤼케르트>
학자들이란 장황하고 복잡한 오류를 즐기는 능력으로 자기를 보통 사람들과 구분하는 사람들이다. <아나톨 프랑스>
--- 클라우스 발러(Klaus Waller(1946~): LEXIKON DER KLASSISCHEN IRRTÜMER.
안미현 옮김: 인류 최대의 착각과 오류 사전(해냄. 2001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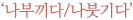
남녘에서는 ‘나부끼다’로 적고,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과 북녘에서는 ‘나붓기다’로 적어 온다. 북녘의 첫 국어사전은 1956년에 낸 <조선말 소사전>이다. 남녘에서 ‘나부끼다’로 적는 것은 한글학회의 <큰사전>(1947)을 따른 것이다. <큰사전>이 ‘나부끼다’로 적은 것은 최초의 한글 맞춤법인 조선어 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 10.)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주| ‘맞춤법’을 처음에 ‘마춤법’으로 적다가 세째 판인 1940년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부터 ‘맞춤법’으로 적었다.
그 제3항은, “한 단어 안에서 아무 뜻이 없는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모두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하고 ‘나부끼다’, ‘아끼다’ 등을 포함한 13 낱말을 예로 보였다.
<큰사전>(1929~1957)의 집필은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 최초의 맞춤법 통일안(1933)과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이 발표되던 때와 관련이 있다. 달리 말하면 <큰사전> 집필 때문에 그때 비로소 맞춤법 통일안과 조선어 표준말이 마련된 것이다. 이후 한글 맞춤법은 수정을 거듭하게 되고, 표준말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맞춤법의 첫 고친판은 불과 4년 뒤인 1937년에 발표되었다. 이 고친판의 3항에는 문제의 ‘나부끼다’가 예(보기)에서 빠져 있다. 초판에 13 낱말을 예로 보였던 것을 고친판에는 ‘나부끼다’를 제외한 18 낱말을 보였다.
<큰사전>의 ‘나부끼다’는 1937년의 고친판 맞춤법을 살펴보지 못해 그냥 유지된 것이다. <조선어 표준말 모음>(조선어 학회. 1936)의 ‘둘째 비슷한 말’ 목록(77쪽)에도 ‘나붓거리다’와 함께 ‘나붓기다’를 보였다. 문세영 사전(1938)과 북녘에서 ‘나부끼다’가 아닌 ‘나붓기다’로 적은 것은 고친판 맞춤법의 추이를 읽었던 것이다. ‘나붓기다’는 ‘나붓나붓’과 나붓거리다’ 등의 어간 ‘나붓-’을 밝혀 적는 한무리 표기 형태이다.
‘나부끼다’는 마침 겨레말 큰사전 남북 표기 분과 위원회가 12차 회의에서 ‘나붓기다’로 적도록 합의안을 마련하여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a 잘 때 머리에 쓰는 수건. <국어국문학회: 국어 새 사전>(동아출판사. 1958년)
b 방사(房事) 후 닦는 수건. <신기철 외>
c 방사(房事) 후 씻는 수건 <민중서림>
d 남녀가 동침할 때 쓰는 수건. <금성판>
e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할 때 사용하는 수건.
[예문] 그들은 침대에 감잡이를 깔고 첫날밤을 준비했다. <고려대>
f 전날에, 잘 때 녀자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 <조선말대사전>(북. 1992)
알다시피, 동사 ‘쓰다’에는 뜻범주가 다른 동음어들이 있다(글을 ~./ 모자를 ~./ 약으로 ~. 등). <큰사전> 집필자가 ‘감잡이’를 풀이하면서 한자어 ‘사용하다’를 피해 “잠자리할 때 쓰는 수건”이라 한 데서 a와 f사전은 머리에 쓰는 것으로 착각했고, f 사전은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으로까지 발전했다. ‘쓰는’ 수건을 ‘닦는’ 수건, ‘씻는’ 수건으로 해석한 사전은 그나마 실수는 면했다고 할까?
또 a와 f사전은 ‘잠자리할 때’를 ‘동침하다’로 이해하지 못해 그냥 ‘잘 때’라 했다. 머리에 썼던 수건도 잘 때는 벗을 텐데 잘 때 수건을 쓴다는 것은 이상한 발상이다.
e사전에는 예문까지 보였는데 출전이 없는 것으로 보아 편찬자의 작성문으로 보인다. 작성한 예문은 맞춤식이어서 자연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
글의 소통을 위해서는 글쓰는 이는 읽을 이를 생각하여 분명한 표현에 힘써야 하고, 읽는 이는 어떤 글이고 새겨읽는(정독하는) 자세가 필요한 사례라 하겠다.


한글학회 <큰사전>(1957) 넷째 권에 ‘아이스캔디(Ice candy)=얼음엿.’으로 올린 것이 있었다. 그러나 ‘얼음엿’은 표제어로 없었다. 이 넷째 권은 육이오 전란통에 급하게 조판하여 지형을 뜨느라 빠뜨린 올림말과 적잖은 잘못이 있어 본문 뒤에 고침표 6쪽을 붙여서 낸 책이다. 그 붙임 자료 중 본문에 더할 항목에 ‘얼음엿’(아래)이 있었다.
얼음-엿 [이] 달걀, 우유, 설탕, 옥수숫가루 따위에 향료를 섞어서 얼리어 만든 엿.
(아이스캔디=Ice candy).
이 뜻풀이 끝에 대어 놓은 괄호 속의 ‘아이스캔디’는 일종의 동의어 제시였다. 외래어 ‘아이스캔디’를 우리말로 다듬어 ‘얼음엿’을 실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서양 냉과류를 “얼리어 만든 엿”이라 한 것은 이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1980년대 이후에는 ‘아이스캔디’의 동의어가 ‘얼음과자’로 바뀌면서 얼음엿은 아이스캔디와의 관계를 잃어버렸다. 그런데도 사전에는 ‘얼음엿’을 동의어 ‘아이스캔디’만 지우고 그냥 두어서 마치 우리 엿의 한 종류처럼 남아 있게 되었다. ‘아이스캔디’란 말도 없어졌으니 그 다듬은 말 ‘얼음엿’도 폐어 목록에나 보냈어야 할 말이었다.

문세영 사전(1938)은 ‘하릅송아지’만 올렸다가 증보판(1940)에 ‘하릅강아지’도 올려 ‘하룻강아지’의 사투리라 풀이했다. 한 살 된 ‘하릅송아지’는 표준어로 올리면서 한 살 된 ‘하릅강아지’는 ‘하룻강아지’의 사투리로 처리한 것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같은 속담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 <큰사전>과 <문세영 사전>의 원고 집필 시기는 1930년대의 비슷한 시기였다고 본다.
그러나 속담에서 ‘난 지 얼마 안 되는 강아지’를 가리킨 이 말은, 난 지 하루밖에 안 되어 눈도 제대로 못 뜨는 ‘하룻강아지’보다 한 살 된 강아지인 ‘하릅강아지’를 두고 한 말로 보인다. 한글 학회의 <우리말 큰사전>(1992)에는 ‘하룻강아지’를 ‘하릅강아지’의 변한말로 수정하여 그 착각을 일깨웠다.
참고로, 짐승의 나이를 이르는 말에 하릅(1살), 이듭(2살), 사릅(3살), 나릅(4살), 다습(5살), 여습(6살), 이롭(7살), 여듭(8살), 아습(9살), 담불(10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