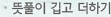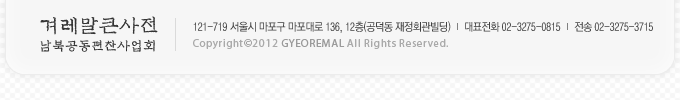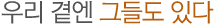
_ 도원영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편찬부 부장
원고 청탁과 함께 국어사전 편찬 환경과 작업 과정의 희로애락, 바람 등을 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들었다. ‘뭐, 할 얘기가 있나’ 잠시 멈칫했다. 곰곰 생각해 보니 잊지 못할 일들이 떠오른다.
1994년 3월 필자가 편찬실 식구가 되어 첫 출근을 한 곳은 고려대학교의 시계탑 건물 뒤편 어두컴컴한 복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방이었다. 남자 화장실을 마주하고 있었고 교수 연구실만 한 공간에 행정 부서, 전자텍스트실, 사전편찬실이 함께 있었다. 올 여름보다 더 지독했던 1994년의 폭염 속에 연구소 식구들 모두 그 공간에 함께 있었다. 박물관 3층에 세 들어 지낼 땐 바로 옆 유물 보관실에서 새어 나오는 포르말린을 마시며 집필을 했다. 햇수로 5년을 채우는 동안 우리는 나중에 썩지 않을 거라는 무시무시한 농을 주고받았다. 유물의 안존을 위해 난방 시설이 없었던 그 건물에서 우린 석유난로로 겨울을 났다. 출산 휴가에서 돌아온 필자는 특별히 더 진할 것도 없는 가스 냄새에 기절해 학교 보건소로 실려 가기도 했다.
어디 힘들었던 게 공간의 문제뿐이랴. 축적된 경험이 없어 문서 작업이건 데이터 관리건 그땐 참 많이도 삽질을 했다. 중요한 자료를 직접 살펴야 할 땐 우리의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도서관 사서 앞에서 쩔쩔 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더군다나 사전 집필과 강의와 연구를 동시에 해야 했기에 몸도 마음도 고달팠다.
아무리 힘든 현재도 과거가 되어 버리면 아련하고 그립게 마련인 모양이다. 우리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맛난 음식마냥 즐겁게 나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환경에서 사전 작업에 매진하는 팀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다. 필자가 한국학 분야에서 사전을 만드는 편찬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문학 사전, 민속 연희 사전, 인물 사전, 지리 정보 사전 등등을 편찬하는 팀들을 만난 바 있다. 우리가 특정한 용어를 집필할 때 찾아보는 전문 사전의 집필자들이다. 편찬실을 방문하고 작업 내용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박에 알아차렸다. ‘아, 그들도 있구나.’ 겨우 깃든 좁은 사무실에서 시간과 비용에 쫓기며 갖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그들. 자료 확인을 위해 주요 기관의 사서들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도 전에 없는 사전, 전보다 나은 사전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들. 해당 분야에서는 촉망받는 소장학자이지만 사전 편찬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3D 업종에 종사하는 이가 되어 지난한 작업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
국어사전을 편찬하고 연구하는 우리의 환경이 그래도 좀 나은 게 아닌가 싶다.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편찬의 노하우와 운영의 지혜를 쌓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고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분야에서는 변방의 투사들이다.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참고 자원, 그리고 주변의 응원도 지원도 그들의 앞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겐 제법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 그들에겐 여전히 부재하거나 부족하여 갈증 상태에 허덕이면서 외로이 행군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을 바꾸어 줄 순 없어도 시간과 비용을 대어 줄 순 없어도 우리가 가진 편찬 자원과 노하우, 그리고 운영의 지혜는 나눌 수 있지 않은가. 국어사전 편찬자들이 연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우리 곁엔 그들도 있다!
| 도원영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현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이면서 사전편찬부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