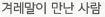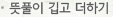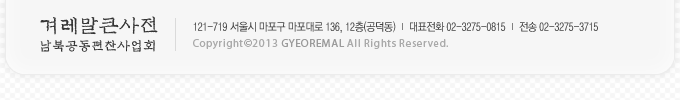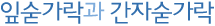
_ 박일환 / 개웅중학교 국어 교사, 시인

숟가락을 만드는 재료는 주로 쇠붙이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 나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쇠숟가락’과 ‘놋숟가락’만 표제어로 올라 있을 뿐 ‘나무숟가락’은 올라 있지 않다. 반면에 ‘나무젓가락’과 ‘대젓가락’은 표제어 대접을 받고 있다. 아마도 실생활에서 나무로 만든 숟가락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나무로 만든 젓가락은 그보다 많이 사용해서 그리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겠는데, 합리성을 띤 대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숟가락의 모양이나 쓰임새에 따라 달리 부르는 이름들도 있다. 우선 ‘잎숟가락’이라는 말을 살펴보자. 사전에는 ‘얇고 거칠게 만든 숟가락’이라는 풀이를 달아 놓고 있다. 그렇다면 앞에 붙은 ‘잎’은 나뭇잎을 가리키는 걸까? 언뜻 생각하면 나뭇잎처럼 얇게 만든 숟가락이라는 뜻으로 만든 말처럼 보일 수도 있다. ‘성냥의 한 가지. 얇은 소나무 개비의 한끝을 삼각형으로 만들고, 그 끝에 유황을 묻혀서 불에 대어 불이 옮아 붙게 한다.’라는 뜻을 지닌 ‘잎성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닢’이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납작한 물건을 세는 단위. 흔히 돈이나 가마니, 멍석 따위를 셀 때 쓴다.’라는 풀이가 나온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며, 잎숟가락은 ‘닢+숟가락’에서 왔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물론 ‘닢’이 나뭇잎의 ‘잎’에서 왔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닢이 먼저 생겨서 쓰이다가 나무와 결합했을 수도 있다.
‘잎숟가락’이 있다면 그와 반대의 뜻을 지닌 낱말이 있으리란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간자숟가락’이 이에 해당하는 말인데, ‘곱고 두껍게 만든 숟가락’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줄여서 ‘간자’라고도 부르며, 줄여서 말할 때는 ‘어른의 숟가락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 하나 더 붙는다.
이밖에도 ‘끝이 다 닳아서 무디어진 숟가락’을 ‘모지랑숟가락’ 혹은 ‘몽당숟가락’이라고 하며, 북한 사전에는 같은 뜻을 지닌 말로 ‘왜지숟가락’을 올려놓고 있다. 이에 반해 숟가락이 다 닳지는 않고 ‘한쪽이 닳아진 숟가락’은 ‘어석술’이라고 한다. 그리고 ‘쪽박처럼 생긴 숟가락’을 일러 ‘쪽술’이라고 하며, 주로 어린아이들이 쓰는 숟가락으로 ‘자루의 끝에 동글납작한 꼭지가 달린 작은 숟가락’은 ‘꼭지숟가락’이라고 한다. 특별히 ‘저녁밥을 먹는 숟가락’을 ‘저녁술’이라고 하는데, ‘아침술’이나 ‘점심술’ 같은 말은 없다.
마지막으로 숟가락의 구성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을 알아보자. 숟가락의 자루 부분은 ‘숟가락총’이라고 하며, 숟가락 자루와 뜨는 부분이 이어진 곳은 ‘술목’이라고 한다. 북한의 사전에서는 음식물을 떠서 입에 넣는 숟가락 부분을 ‘술잎’, 술잎의 오목한 부분을 ‘술바닥’, 그 뒷부분을 ‘술등’이라고 하며, 술잎의 아래쪽 끝을 ‘술끝’, 둥그런 가장자리를 ‘술날’이라고 한다. 북한이 남한보다는 우리말 보존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남자들이 간혹 술자리에서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손에 쥐고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손으로 잡는 부분이 바로 숟가락총이다. “김 과장이 숟가락총을 거머쥐고 노래를 불렀다”와 같이 쓰면 된다.
남자들이 간혹 술자리에서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손에 쥐고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손으로 잡는 부분이 바로 숟가락총이다. “김 과장이 숟가락총을 거머쥐고 노래를 불렀다”와 같이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