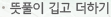_ 김완서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59, 64, 70, 76.
이상은 20살 이후 내 몸무게의 변천 과정이다. 59는 군대 입대 당시의 몸무게이고, 64는 제대했을 때의 몸무게이다. 그 당시만 해도 내 몸무게가 70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 64가 내 몸무게의 절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대학 4학년 때인 26살에 내 몸무게는 70에 도달했다.
이상은 20살 이후 내 몸무게의 변천 과정이다. 59는 군대 입대 당시의 몸무게이고, 64는 제대했을 때의 몸무게이다. 그 당시만 해도 내 몸무게가 70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 64가 내 몸무게의 절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대학 4학년 때인 26살에 내 몸무게는 70에 도달했다.
불과 2년 사이에 6킬로그램이나 살이 찐 데에는 콜라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 공부를 핑계로 아침에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콜라를 들이키고, 점심 먹고 입가심으로 또 콜라를 들이키고, 오후 3시 정도에 잠을 쫓는다는 핑계로 콜라를 들이켰다. 이렇게 하루에 콜라 3캔씩을 약 일 년 정도 매일 먹었다. 콜라 먹고 찌운 살이어서 그런지 내 살은 물렁하기가 그지없다.
대학 졸업하면서 70에 도달한 난, 여전히 콜라를 끊지 못하고 제법 마셨다. 야식도 틈틈이 먹고. 그리하여 결혼 즈음에는 74에 이르더니 결혼하고 일 년 후 정확히 76이라는 숫자에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살찌다 보니 몸이 퍼지다 못해 배만 불룩하게 나온 전형적인 ‘D'자형 체형을 갖게 되었다. 예전의 사진을 찾아보면 임신부 저리 가라할 정도로 배가 현저히 튀어나온 것이 있다.
‘살쪄라’라는 말이 먹을 것이 없던 어려운 시절에는 덕담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살쪘네’라는 말을 들으면 다이어트를 결심케 하는 자극제로 들리거나 욕으로 들린다. 이렇게 세월에 따라 다르게 느끼지는 ‘살찌다’는 남과 북 모두 사용하는 말이다. 또한 남과 북이 사용하는 의미도 같다.
| 표준국어대사전 | 조선말대사전 |
|---|---|
| 살찌다 몸에 살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다. |
살찌다 몸에 살이 많아지다. |
남과 북,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다. ‘살찌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아니라 ‘사용 대상’에서의 차이이다.
- 기르는 닭 중에서 {살찌고} 큰놈은 언제나 집을 제일 많이 떠나있는 광훈의 몫으로 차례지군 했었다.《백현우: 젊음을 자랑하라》
- 철쭉꽃이 붉게 타는 산비탈이 가까이 보이는데 그 너머 쑥밭속에서는 {살찐} 장꿩 무리가 한가로이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오가며 빨간 머리를 기웃기웃하였다.《량경찬: 호수가의 저녁》
- 림성철이 소로 판대기 써레를 치고 있었다. {살찐} 황소를 이리저리 능숙하니 몰아가면서 바닥매를 고루는데 그 솜씨가 실농군 찜 쪄 먹을 정도다.《리성식: 행복의 방아》
용례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북은 ‘살찌다’를 주로 동물에게 사용하는 반면에 남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두루 사용한다.
그럼 북에서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쓸까? 남쪽 사전에도 있는 말이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다. 그것은 ‘몸이 나다’로, 북에서 사람에게는 ‘살찌다’ 대신에 ‘몸이 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 사십 줄에 들어서면서 {몸이 나기} 시작한 그는 실한 량 어깨를 알릴 듯 말 듯 기울거리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리화: 출근길》
- 맹물만 먹어두 이렇게 {몸이 나는} 걸.《한기석: 꽃바다》
- 힘은 세지만 {몸이 나서} 달리기나 걷기에서는 애를 먹는 태실이였다.《한기석: 꽃바다》
- {몸이 나서} 교복 샤쯔의 겨드랑이 혼솔이 터질 것처럼 팽팽히 불어난 수옥이는 뚱보체질에 어울리지 않게 손으로 치마깃을 애교스레 비다듬으며 일어났다.《백의남: 넓은 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