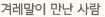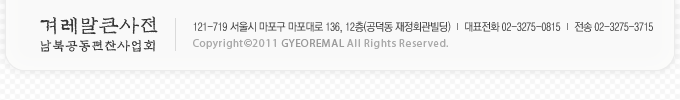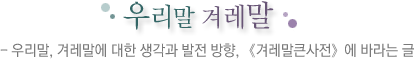
_ 고경희 / 시인, [사]한글문화연대 대표
"사실 우리는 남한이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하는 것은 잘 몰라요. 남한 체제가 어떻고 남쪽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되고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 북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이 문화의, 사상의 중심인지 그런 것은 더더구나 어려워서 잘 몰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조국은 그저 하나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그래서 그리운 나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가면 나를 꽉 안아줄 것 같은 나라, 우리말이 통하고 편안하게 말해도 알아들어 주는 나라, 그것이 조국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준 말을 눈물 나도록 거침없이 써도 되는 나라, 그저 그 조국은 남이든 북이든 나뉘지 않아요.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거기 그렇게 있어 자랑스러운 나라, 나는 한국 사람이고 조국은 남북 어느 쪽이 아니고 그저 하나에요."
재일교포 한 여고생의 단호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몇 해 전 나는, 반한 감정이 고조된 일본의 재일교포학교에 가 있었다. 등굣길에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곤욕을 치르고, 매일 누군가에 의해 학교 울타리가 부서지고, 교문에 철조망이 둘러쳐 있기도 하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뜯어내고 학교 안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던 그 무렵이었다. 그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먹고 자고, 수업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도 나눴다. 그러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동포의 수난을 목격하고 같이 울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바로 전쟁 같았다. 한국인이라는 표시인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은, 적진을 뚫고 나오는 용기였다. 등교하는 아이 중에는 더러더러 교복을 보자기에 싸 와서 교문 안에 들어온 다음 갈아입기도 했다. 나는 나이 어린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나누는 뜨거운 눈빛과 눈물의 아침인사를 들었다. 어서 와라 무사히 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기숙사의 저녁, 아이들이 나누는 말은 철저하게 우리말이다. 거의 다 부모 세대에 일본으로 건너온 2세 3세인 아이들이라는데 한 마디 일본말도 섞여 있지 않았다.
저녁밥을 먹기 시작할 때, 나는 한 아이에게 뜨거운 국을 건네며 말했다. "뜨겁다 델라 조심해라." 그러자 유심히 듣던 한 아이가 옆에 아이에게 국그릇을 건네면서 그대로 따라 했다. "뜨겁다 델라 조심해라." 그러자 그 아이가 또 옆에 아이에게 말했다. "뜨겁다 델라 조심해라." "뜨겁다 델라 조심해라." "뜨겁다 델라 조심해라." 장난하듯 웃으며 소곤소곤 돌림노래처럼 따라 하는 아이들을 보며 의아했던 나는 저녁상을 물린 뒤, 앳돼 보이는 여선생에게 물었다. 선생의 답은 이랬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질구레한 어휘들도 목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들으면 그걸 잊지 않기 위해 되풀이해 써본답니다." 그래서 국어책에서 쉽게 접하는 말이 아닌 내 말이 재미있고 좋았던 모양이라고 했다. 가슴이 먹먹해 왔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 민족에게 있어 우리말, 겨레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 한 많고 설움 많은 나라 밖 동포들에게 우리말 우리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가,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할까?
고국에선 물과 공기 같아 휘젓고 오염시키며 함부로 쓰는 우리의 말글이 여기 이 일본 한 구석에서 어떤 잉앗실이 되어 저 아이들을 저토록 치열하게 서로 단단히 묶고 지키고 살아가게 하는가?
다시 우리나라 안으로 눈길을 돌려본다.
여전히 한문과 한자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영어를 섞어 써야 품위와 교양을 갖춘 사람대접을 받는 우리 사회의 제도나 조건들, 국어를 가볍게 여기며 영어교육만 강조하는 정부,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우수 정예라 뻐기는 기업 ‧ 언론들에 의해 쉽게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리는 우리말글. 그리고 그들을 향해 목청을 높이고 꼬집어내고 꾸짖어 겨우 한두 개 바로잡고는 대단한 성과라도 얻은 양 가슴을 쓸어내리던 일들, 이 초라한 실랑이를 과연 이들에게 무어라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 말글로 글을 쓰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대학 때 노교수님 말씀이 우렁우렁 바다를 건너와 가슴에 울렸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학자 관리들이 한문을 빌려 쓰던 시대의 습관에 젖어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낮잡아보고 한자로 글자생활을 해야 글과 뜻을 깨닫고, 품격이 높아지는 것이라 우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문명과 상업주의 문화에 기댄 외국말, 일본말의 찌꺼기들이 순수한 겨레말을 죽이고 버젓이 품위 있는 낱말로 사전에 올라 있다.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어는 문화어로서의 지위를 잃고, 고유어에 바탕을 둔 학문과 문명을 일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얼을 간직한 겨레말은 더 많이 국적도 모르는 말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 앉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겨레가 물려받은 말글 문화를 모으고, 정리하는 《겨레말큰사전》편찬은, 남과 북의 어휘는 물론 지역어 토박이말 또 나라 밖 세계 각 곳곳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동포의 모국어도 살뜰히 챙겨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숙제가 있다. 하나의 대한민국 남과 북의 깨끗한 정서 속에 오염되지 않은 낱말들을 알뜰히 찾아 그 위상을 높이고 모두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부려 쓸 수 있게 하는 게 제일이다. 그래야 원하지 않는 분단의 오랜 세월 서로 뜻이 갈려 소통이 어려운 우리 겨레를 이어서 통일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국의 맥을 바로 세우고 흩어져 사는 겨레를 한 끈으로 잇는 것은 국어를 왜곡, 파괴하면서 이루려는 뭉뚱그려진 '세계화'가 아니다. 사람이다. 겨레고, 겨레문화이고, 그 겨레가 가진 의식과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다. 우리 핏줄 누구나가 가슴으로 만나는 우리의 말과 글이다. 그리고 나라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은 역사의 고비마다 한 시대를 꿰뚫어 미래를 가늠하고 올곧은 길로 이끄는 사람들의 피와 땀이다.
《겨레말큰사전》이 그 오랜 숙원을 풀어내어 나라 안팎 세계 구석구석 동포들의 안방에 자리 잡아, 목마른 겨레의 가슴마다 뜨끈한 역사를 안겨주기 바란다.

| 고경희 |
경희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였으며, 198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개화」,「구경꾼은 안다」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아홉의 끈을 풀고』, 『사슬뜨기』, 『창백한 아침』, 『안개구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