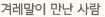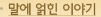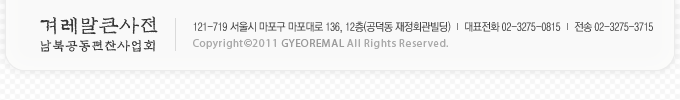_ 조헌용 / 소설가
지금은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몇 가지 짧은 말들로도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어른들을 볼 수 있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아이구 형님, 참말로 거시기하요. 거시기하지라?”
“나야 늘상 거시기하지 뭐. 어찌 자네도 거시기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며 이 즈음까지의 대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리가 가능한 것들이다. 그래, 어른들의 말은 어린 내게 이해가 아니라 추리로 짐작되는 그런 말들의 수수께끼였다. 추리해보면 이 정도.
“아이고 형님, 참말로 오랜만이요. 안녕하지라?”
“나야 늘 그렇지 뭐. 그래 자네도 안녕하고?”
그러나 이어지는 말들은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했다.
“근디 형님, 낼 모레 성수 거시기가 거시긴디, 어찌 거시기할라요?”
“음마, 거시기 거시가 벌써 거시기가 됐어? 그려, 거시기가 어디란가?”
“저기 월명 거시긴가, 은파 거시긴가? 근디 거시기를 어찌 해야할랑가 모르겠당게요.”
“거시기야, 뭐, 대충 거시기 하믄 쓰지. 근디 말여, 거시기 죽어도 거시기한다더만 어찌 거시기를 했대?”
“긍게 말이요. 엊그제 봤을 때만 해도 거시기가 거시기 아니더만요. 글도 거시기 이기는 거시기 없응게요, 이.”
“긍게, 이. 암튼 모르겠네. 그럼, 거시기 하세, 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른들의 수수께끼 앞에서 어린 나는 어쩔 수 없이 도리머리를 흔들어야 했다. 어떤 날에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기어이 아버지의 바지춤을 잡아끌기도 했다.
“아빠, 삼룡이 아제가 뭐라는데요?”
“뭐라기는, 윗동네 성수 딸내미 결혼한다고 안혀냐?”
“예에?”
나는 자못 궁금해 다시 한 번 말의 내용을 물어보아야 했다.
“아따, 이놈이 왜 근다냐, 이. 저기 성수 딸내미 거시기 안 있냐, 이. 그려, 영미 갸가 이번 주에 결혼한다고 어쩔 거냐고 묻누만. 근디 어찌긴 어쩌야, 가봐야지. 내가 간다고 헝게 삼룡이가 글믄 부조를 얼마나 하냐고 해서 내가 적당히 하믄 쓰겄다고 안 혔냐. 근디 성수가 지 딸 결혼을 그렇게 반대 했어야. 그래서 어찌 허락을 했냐고 나가 물응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해서 내가 맞는 말이라고 함서 지금 안 헤어졌냐, 이. 근디 니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왜 자꾸 그리 묻는다냐?”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메지 놓고 또 어딘가로 훌훌 막걸리라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마실을 떠나고는 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 그때 마을 어른들이 쓰는 말들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이름의 상징으로 이루어진 기호가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얻어지는 어울림이었다. 그러나 지금 고향 마을에 ‘거시기’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남아 있지 않다. 대체로 나가거나 혹은 몇몇 남아 있어도 그 옛날 숟가락 숫자까지 세세히 알 고 있을 정도로 끈끈한 어울림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말이란 이렇게 때때로 상징적 기호 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말은 한 무리의 어울림을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예컨대 거시기 하나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거시기는 단순히 거시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첫 소설집을 묶을 때 부러 멀어지는 우리말을 잡으러 진둥한둥 애를 썼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동티라도 붙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말은, 말들은 저근듯 멀어졌다. 참말이지 말은, 우리 겨레의 말은 들판을 달리는 말과 같았다. 거시기 하나로 소통하던 마을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겨레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겨레말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딘지 뿌리도 알 수 없는 말들이 지천이다. 그걸 나무랄 생각도 나무랄 입장도 아니라는 걸 나는 잘 안다. 말이란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섭섭한 마음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겨레의 말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웃음과 여유로움이 가득한 우리 겨레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어떤 이는 우리 겨레의 정서가 한(恨)의 정서라고 하지만 나는 이 말에 감히 반대를 하고 싶다. 어찌하여 우리 겨레의 정서가 한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겨레의 정서는 어울림의 정서이다. 북방의 어느 민족이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터를 잡고 처음 한 것이 바로 곰을 모시는 부족과의 어울림이었다. 물론 그때 어울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호랑이 모시는 부족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겨레는 유럽의 신화처럼 싸움과 전쟁을 기록하기 보다는 어울림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그것을 세상 다스리는 이치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서로 어울려 널리 이롭기를 바랐던 우리 단군의 신화이다.
이처럼 우리 겨레의 정서는 슬픔과 원한의 그것이 아니라 상생과 어울림의 그것이다. 말이라는 것이 사회 속의 부산물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말이 어울림의 말이라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이다. 나눔, 마을, 두레, 누리, 애오라지, 가시버시, 동무와 같이 어울림을 나타내는 말들이 특히 순우리말로 발달했다는 게 그런 사실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어떤 선생은 ‘내일’이 없음을 탓하며 겨레말을 깎아내리기도 했다. 겨레말에 ‘내일’이라는 것이 없던가? 아니다, 지금은 비록 잘 쓰이지 않지만 ‘올제’가 있고, 조금 양보하자면 ‘하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내일 보다 더 먼 미래를 뜻하는 모레와 글피가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아름다운 우리 겨레의 말들은 사라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꾸만 자꾸만 몽니난 마음을 다스려 보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쉬 달래지지 않는다.
거시기 하나로도 충분했던 어울림, 그런 말은, 말들의 잔치는 이제 아주 멀어진 것일까.

| 조헌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