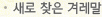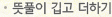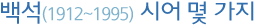
_ 조재수 /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백석시의 해설과 어휘 풀이를 보인 논문과 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백석의 주요 시편은 주로 1930년대 작품들이며, 그 시어에는 출신 지역인 평북(정주) 일대의 토박이말이 더러 있다. 그 토박이말 시어 중에는 오늘날 파악하기 어려운 말도 없지 않다. 원본(초간본) 또는 정본으로 알려진 백석 시집들(아래 문헌)에서 그 동안 밝혀 온 시어의 풀이 가운데 다시 짚어봐야 할 어휘가 있어 옅은 생각이나마 펴보려 한다.
원본(초간본)을 인용하되, 띄어쓰기는 일부 현행 맞춤법에 따라 고쳐서 보인다.
[백석시에 관한 문헌]
이동순: 백석 시전집(부록: 낱말 풀이). 창비. 1987.김학동: 백석 전집. 새문社. 1990.
송준: 백석 시전집(부록: 시어 사전 외). 학영사. 1995.
김재용 엮음: (증보판) 백석 전집. 실천문학. 2007.
고형진 엮음: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이숭원: 백석을 만나다 ---백석 시 전편 해설. 태학사. 2008.
‘갖사둔’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갖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사슴. 1936. 1. 20.)
‘갖사둔’을 ‘갓사돈’의 잘못으로 보고 ‘새 사돈, 새사돈’이라 풀이하였다.
‘재당’은 ‘재장(齋長)’의 평안도식 발음으로 보인다. 성균관이나 향교 같은 데에서 생활하던 유생의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초시(初試)’는 과거의 첫 시험에 급제한 사람.
‘문장(門長)’은 한 문중에서 항렬과 나이가 가장 위인 사람.
‘더부살이 아이’는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지내면서 일을 해주는 아이.
‘사돈(査頓)’은 만주어 ‘사둔(sadun)’의 취음이다. 취음 한자는 어원과 관계가 없다.
열거 대상 가운데 ‘나그네와 주인’, ‘할아버지와 손자’, ‘큰개와 강아지’는 맞섬말(대칭어)의 짝이다. ‘재당과 초시’, ‘문장(門長) 늙은이와 더부살이 아이’는 약간 격이 다른 대칭어로 볼 수 있겠다. ‘새사위’와 ‘갖사둔’의 경우는 ‘갖사둔’을 ‘갓사돈’으로 보면 ‘새사위와 새사돈’으로 대칭된다. ‘붓장사와 땜쟁이’는 대칭어로 관련 지을 수 없고.
백석은 왜 ‘새사위’와 같이 ‘새사둔’이라 하지 않고 ‘갖사둔’이라 했을까? ‘갖사둔’은 ‘갓사돈’을 잘못 적은 것일까?
백석은 글쓰기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지켜 쓰지 않았다 해도 그의 시에 ‘갓’과 ‘갖-’은 가려서(구별해) 썼다. |주| 아래 보기에 출전 제목은 생략함. 괄호 안 표기는 필자가 넣음.
갓. 삿갓. 갓진창. 갓신창(갖신창). 갓기도(같기도) 하다. 갓고(같고).
우리 엄매가 나를 갖이는(가지는) 때. 갖사둔(?). 나물매(나물메) 갖후어(갖추어) 놓고
어데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제(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거미가 이번엔 큰거미 없어진 곧(곳)으로 와서 아물걸인다(아물거린다) <수라(修羅)>(사슴. 1936. 1. 20.)
갓 [부사] 바로 금방. 금방 새로. *갓 시집온 여자. *갓 태어난 아기. *갓 빚은 술.
갓- [접두]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따위의 나이를 나타내는 수사 앞에 붙어) '바로', '막', '겨우'의 뜻
을 나타냄. *갓-스물. *갓-서른. *갓-쉰.
갓병아리 [갓+병아리] [명] 갓 까나온 병아리. <현대조선말사전>(북. 1969), <조선말대사전>(1992) |주| 형태소 분석은 필자가 넣음.
갖^1 [명] ① 모물(毛物). ② '물건'의 옛말. <문세영>
갖^2 [명] <옛> 가지(나뭇가지).
갖^3 [부] 조금 전. 막. <문세영> [참고] <문세영>은 ‘갓밝이’도 ‘갖밝이’로 올렸음.
갖- [접두] '가죽', '털가죽'을 나타냄. *갖-신. *갖-옷. *갖-저고리. *갖-바치. *갖-풀. [참고] 갗<옛말>.
그러나 백석이 그의 시에 ‘갓’과 ‘갖-’을 가려서 썼으며, ‘새사위’와 같이 ‘새사둔’이라 하지 않고 ‘갖사둔’이라 한 데에는 ‘갓사돈(새사돈)’이 아닌 딴 뜻의 말로 쓴 것이 아닐까?
역시 드물지만, 북의 사전에 ‘갖-+~’ 형식의 단어에서 어간 ‘갖-’이 ‘가지, 곁가지’의 뜻으로 쓰인 올림말이 있다.
*세 갖바리. *네 갖바리. <현대조선말사전>(북. 1969), <조선말대사전>(1992)
|주| ‘갖바리’는 어근 ‘갖-’에 접미사 ‘-바리’가 붙은 말. ‘-바리’는 ‘군-바리’, ‘하-바리’처럼 특정한 성질이나 신분을 지닌 사람 또는 물건을 나타내는 말. 사람의 경우, 좀 속된 뜻빛깔을 띤다.
북의 ‘갖바리’처럼 백석시의 ‘갖사둔’이 ‘가지사돈’이라는 뜻으로 친사돈이 아닌 방계 사돈, 곧 ‘곁사돈’을 이른 말이 아닐는지.
‘재당과 초시’, ‘문장 늙은이와 더부살이 아이’의 관계처럼 약간 격이 다른 대칭어 열거로, ‘새사위’에 직접적인 ‘새사둔’이 아니라 ‘곁사둔’을 짝지어서 모닥불을 쪼이는 대상의 외연을 더 넓혀 아우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깔이다’와 ‘방요’
여우가 우는 밤이면
잠 없는 노친네들은 일어나 팟(팥)을 깔이며 방요를 한다
여우가 주둥이를 향하고 우는 집에서는 다음날 으레히(으레이->으레) 흉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 <오금덩이라는 곧(곳)>(사슴. 1936. 1. 20.)
그 동안 이 문장을, 잠 없는 늙은 여인들이 “팥을 뿌리고 방뇨를 한다”, “팥을 마당에 뿌려 깔면서 방뇨를 한다”로 풀이했다. 두 해석은 팥을 뿌리고 방뇨(오줌누기)를 하는 것을, 민간 신앙에서 흉사를 막고 악귀를 쫓아내는 행위로 보았다.
평안 등지의 방언에 곡식을 키로 ‘까부르다, 까불다’를 이르는 ‘까리다’가 있다.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2)에 거두어 실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이북 5도 군지 등의 지역어에서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시의 팟(팥)을 ‘깔이며’는 팥을 키로 ‘까부르며’로 볼 수 있다.
‘방요’는 ‘방뇨(放尿)’를 잘못 적은 것일까? 백석의 시에서 오줌과 관련된 단어에 ‘童尿賦(동뇨부)’가 있다. 오줌싸개 아이에 관한 시 제목이다. 백석은 한자 ‘尿’를 한글로 ‘뇨, 요’로 적지 않았다. ‘방요’가 ‘방뇨’라면 한자 ‘放尿’로 적었을 법 하다.
이 ‘방요’를 <겨레말큰사전> 북측 편찬 위원장 문영호 님은 ‘민요조의 군소리’로 해석했다. 필자는 그 해석을 좇아 ‘일하면서 읊조리는 민요’의 뜻으로 ‘方謠(방요)’를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이런 한자 단어가 쓰인 문헌은 찾지 못했다. 믿음이 별난 신자가 성령의 기운을 받아 내용을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방언을 한다”고 한다. “방요를 한다”도 비슷한 맥락의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