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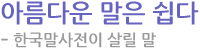
_ 최종규 / 작가
흔히 ‘국어사전’을 말하고, 학교에서는 ‘국어’를 가르칩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분은 으레 ‘국민’을 얘기합니다. 한자로 ‘國-’을 붙이는 한자말이 퍽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람이 ‘國-’을 붙인 낱말을 쓴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아주 마땅합니다. 한국사람으로서 이런 낱말을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한복·한식·한옥’ 같은 낱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옷·밥·집’입니다.
‘國-’붙이 낱말 가운데 ‘국민학교’만큼은 몹시 어렵게 ‘초등학교’로 바꾸었습니다. ‘국민(國民)’이라는 한자말에 깃든 슬프며 아픈 생채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國語’라는 한자말을 그대로 쓰지만, 이 낱말을 앞으로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어른들은 ‘국민’이라는 낱말을 털어냈는데, 말과 글을 다루는 어른들은 언제쯤 ‘국어’라는 낱말을 털 수 있을까요.
‘國歌·國鳥·國花’ 같은 낱말을 곧바로 알아듣는 아이는 드뭅니다. 어른도 곧잘 헷갈릴 만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낱말을 쓰더라도 한국은 한국말이 있으니 이런 낱말을 ‘나라노래·나라새·나라꽃(나랏노래·나랏새·나랏꽃)’으로 새롭게 지어서 쓸 줄 알아야 하고, 이런 낱말을 사전에 담을 수 있어야 해요. 한국말을 담는 한국말사전은 한자말을 담는 사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전들은 한국말을 슬기롭게 담거나 한국말을 알뜰살뜰 가꾸는 길하고는 동떨어집니다.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며 옆에 놓는 사전조차 교과서에 실은 낱말을 풀이하는 참고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어린이가 스스로 한국말을 슬기롭게 깨우치면서 말빛을 가꾸도록 돕지 못합니다.
 푸성귀나 남새나 나물을 제대로 살피는 어른이나 아이는 몇쯤 될까 궁금합니다. 국립국어원 사전 말풀이를 살피면, ‘푸성귀’는 “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하고, ‘남새’는 “= 채소(菜蔬)”라 하며, ‘나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합니다. ‘채소(菜蔬)’는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이라 하고, ‘야채(野菜)’는 “(1) 들에서 자라나는 나물 (2) ‘채소(菜蔬)’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합니다. 그런데 ‘야채’는 ‘やさい’라는 일본말에서 비롯했다고들 합니다. 여러모로 살피면, 풀을 먹는(채식) 사람이건 풀을 안 먹는 사람이건, 풀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릅니다. 말을 다루는 사전도 이를 옳게 가누지 못합니다.
푸성귀나 남새나 나물을 제대로 살피는 어른이나 아이는 몇쯤 될까 궁금합니다. 국립국어원 사전 말풀이를 살피면, ‘푸성귀’는 “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하고, ‘남새’는 “= 채소(菜蔬)”라 하며, ‘나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합니다. ‘채소(菜蔬)’는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이라 하고, ‘야채(野菜)’는 “(1) 들에서 자라나는 나물 (2) ‘채소(菜蔬)’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합니다. 그런데 ‘야채’는 ‘やさい’라는 일본말에서 비롯했다고들 합니다. 여러모로 살피면, 풀을 먹는(채식) 사람이건 풀을 안 먹는 사람이건, 풀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릅니다. 말을 다루는 사전도 이를 옳게 가누지 못합니다.
사람이 따로 길러서 먹는 풀일 때에 ‘남새’입니다. 스스로 돋는 풀일 때에 ‘나물’입니다. 남새와 나물을 아우를 때에 ‘푸성귀’입니다. 풀을 먹는 사람, 곧 ‘채식’이란 “푸성귀 먹기”이거나 “풀 먹기”이거나 “풀밥 먹기”예요. 이러한 얼거리를 살핀다면, ‘채식(菜食)’이라는 말을 털면서 ‘풀먹기’나 ‘풀밥’ 같은 낱말을 지을 수 있고, 학자들이 먼저 이런 낱말을 사전에 담을 수 있어요.
만화영화 〈백설공주〉를 아이들과 보던 곁님이 문득 ‘하얀눈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일곱 살과 네 살인 아이들한테는 ‘백설공주’가 어떤 이름이고 뜻인지 알려주기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내어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요즈음 ‘에코백(ECO-BAG)’이 널리 퍼지지만, 나는 늘 ‘천바구니’를 챙깁니다. 시골 읍내에는 없으나 도시로 마실을 가면 으레 ‘네일아트’를 하는 가게를 봅니다. 이런 가게를 스치고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저곳에서는 손톱에 꽃이 피도록 하는구나 하고. ‘손톱꽃’이라고 할까요, ‘손톱빛’이라고 할까요.
사전을 보면 풀 빛깔을 가리키는 ‘풀빛’이라는 낱말은 있지만, ‘꽃빛’이나 ‘잎빛’ 같은 낱말은 없습니다. 우리 사전은 어떤 낱말을 얼마만큼 실을 때에 아름다울까 궁금합니다. ‘설빔’처럼 ‘잔치빔’이나 ‘돌빔’ 같은 낱말을 즐겁게 지을 수 있으나, 이런 낱말을 가꾸는 학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전을 살펴서는 ‘가엾다·불쌍하다’나 ‘무섭다·두렵다’나 ‘곱다·아름답다’ 같은 한국말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쉽습니다. 한국말사전에 실을 낱말은 아름다워야지 싶습니다.
| 최종규 |
국어사전 만드는 일을 하고, 전남 고흥에서 ‘사진책도서관 함께살기’를 운영한다. 한국말을 슬기롭게 쓰는 길을 밝히고 싶어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사자성어 한국말로 번역하기』,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 『뿌리깊은 글쓰기』, 『사랑하는 글쓰기』, 『생각하는 글쓰기』같은 책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