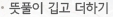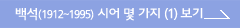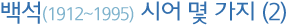
_ 조재수 /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백석 시에 관한 문헌은 여러 가지가 있다. 초간본으로 엮은 시집, 정본 작업을 하여 엮은 시집, 초간본과 정본을 함께 보인 시집, 여기에 시어 풀이를 붙인 시집, 또 시어 풀이에 해설을 더한 시집 등이 있다. 작품만 모아놓은 시 전집보다는 시어 풀이나 해설을 더해 놓은 시 전집이 시를 이해하는 데 단연 도움을 준다.
원본(초간본) 또는 정본으로 알려진 백석 시집들에서 ‘다시 짚어보는 시어’의 두 번째 글이다. 원본(초간본)을 인용하되, 띄어쓰기는 일부 현행 맞춤법에 따라 고쳐서 보이기로 한다.
원본(초간본) 또는 정본으로 알려진 백석 시집들에서 ‘다시 짚어보는 시어’의 두 번째 글이다. 원본(초간본)을 인용하되, 띄어쓰기는 일부 현행 맞춤법에 따라 고쳐서 보이기로 한다.
[참고한 백석 시에 관한 문헌]
이동순 : 백석 시전집(부록: 낱말 풀이). 창비. 1987.김학동 : 백석 전집. 새문社. 1990.
송준 : 백석 시전집(부록: 시어 사전 외). 학영사. 1995.
김재용 엮음 : (증보판) 백석 전집. 실천문학. 2007.
고형진 : 백석 시 바로 읽기. 현대문학. 2006.
고형진 엮음 :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이숭원 : 백석을 만나다 ---백석 시 전편 해설. 태학사. 2008.
백석 시 <정문촌(旌門村)>(사슴. 1936. 1. 20.)에서 몇 어휘를 보기로 한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주홍칠이 날은 旌門(정문)이 하나 마을 어구에 있었다
‘孝子盧迪之之旌門’(효자노적지지정문)—몬지가 겹겹이 앉은 木刻(목각)의 額(액)에
나는 열 살이 넘도록 갈지字(자) 둘을 웃었다
아카시아꽃의 향기가 가득하니 꿀벌들이 많이 날어드는 아츰
구신은 없고 부헝이가 담벽을 띠쫗고 죽었다
기왓골에 배암이 푸르스름히 빛난 달밤이 있었다
아이들은 쪽재피같이 먼길을 돌았다
旌門집 가난이는 열다섯에
늙은 말군한데 시집을 갔겄다
‘정문(旌門)’은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여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이다. ‘홍문(紅門)’이라고도 한다. ‘정문촌’은 그런 정문이 있는 마을, ‘정문집’은 정문이 세워진 집, 여기서는 귀신이 나올 듯한 묵은 옛 기와집이다. ‘액(額)’은 액자 또는 현판을 말한다.
이 시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그다지 어려운 어휘나 표현은 없어 보인다. 몬지(먼지), 날어드는(날아드는), 아츰(아침), 구신(귀신), 부헝이(부엉이), 말군(말꾼) 등은 비표준어일지라도 잘 아는 말들이다.
‘띠쫗고’, ‘쪽재피’가 좀 낯설지만 ‘띠쫗고’는 문맥으로 보아 ‘들이받고’로, ‘쪽재피’는 ‘족제비’로, 또 ‘가난이’는 여자 아이 아무개쯤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밖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는 ‘둘을 웃었다’와 ‘시집을 갔겄다’의 표현에 생각이 머무를 듯도 싶다.
이 시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그다지 어려운 어휘나 표현은 없어 보인다. 몬지(먼지), 날어드는(날아드는), 아츰(아침), 구신(귀신), 부헝이(부엉이), 말군(말꾼) 등은 비표준어일지라도 잘 아는 말들이다.
‘띠쫗고’, ‘쪽재피’가 좀 낯설지만 ‘띠쫗고’는 문맥으로 보아 ‘들이받고’로, ‘쪽재피’는 ‘족제비’로, 또 ‘가난이’는 여자 아이 아무개쯤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밖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는 ‘둘을 웃었다’와 ‘시집을 갔겄다’의 표현에 생각이 머무를 듯도 싶다.
~을 웃었다
‘孝子盧迪之之旌門’(효자노적지지정문)—몬지가 겹겹이 앉은 木刻(목각)의 額(액)에
나는 열 살이 넘도록 갈지字(자) 둘을 웃었다
소년 백석은 이 정문집 액자(현판)에 ‘효자 노적지의 정문’을 이르는 한문 글귀에 갈지자 둘이 겹쳐 ‘之之(지지)’로 쓰인 것이 우스웠다. 이를 백석은 “갈지자 둘이 우스웠다”라 하지 않고, “갈지자 둘을 웃었다”라 했다.
“갈지자 둘이 우스웠다” 하면 그 둘이 이상했다[형용사]는 말이며, “갈지자 둘을 웃었다” 하면 그 둘을 비웃었다[타동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석이 “갈지자 둘을 웃었다” 한 표현은 비웃은 게 아니고 ‘우습게나 이상하게 생각했다’의 뜻으로 쓰였다. 기존 국어사전에 ‘웃다’의 타동사 뜻갈래에 이런 뜻이 없다.
“갈지자 둘이 우스웠다” 하면 그 둘이 이상했다[형용사]는 말이며, “갈지자 둘을 웃었다” 하면 그 둘을 비웃었다[타동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석이 “갈지자 둘을 웃었다” 한 표현은 비웃은 게 아니고 ‘우습게나 이상하게 생각했다’의 뜻으로 쓰였다. 기존 국어사전에 ‘웃다’의 타동사 뜻갈래에 이런 뜻이 없다.
띠쫗고
‘띠쫗고’의 기본형은 ‘띠쫗다’, 평안 등지의 지역어로 보인다. 방언 문헌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 백석 시를 연구한 이들은 아래와 같이 풀이하였다.
띠쫗고 : 치쪼고. 위를 향해 쪼고. <고형진>
: 들이쪼고. 밖에서 안으로 쪼고. <이숭원>
띠쫗다 : 치쪼다. 뾰족한 부리로 위를 향해 잇따라 쳐서 찍다. <이동순>
띠쫗다 : 부리로 마구 쪼는 행위를 나타냄. <송준>
: 들이쪼고. 밖에서 안으로 쪼고. <이숭원>
띠쫗다 : 치쪼다. 뾰족한 부리로 위를 향해 잇따라 쳐서 찍다. <이동순>
띠쫗다 : 부리로 마구 쪼는 행위를 나타냄. <송준>
“부헝이(부엉이)가 담벽을 띠쫗고 죽었다” 했는데, 부엉이가 왜 담벽을 콕콕 쪼다가 죽었을까?
‘쫗다’는 ‘쪼다’의 평안도, 황해도 말로 전한다. ‘쪼다’를 북의 문화어로는 ‘쫏다(쪼으니, 쪼아)’라 한다.
‘쫗다’는 ‘쪼다’의 평안도, 황해도 말로 전한다. ‘쪼다’를 북의 문화어로는 ‘쫏다(쪼으니, 쪼아)’라 한다.
*석수쟁이(석수)가 돌을 쫗다(쪼다). 벵아리(병아리)가 멩이(모이)를 쫗아(쪼아) 먹다. <김이협: 평북방언사전> |주| 괄호 안의 표기는 필자가. 이하, 마찬가지.
*안마당에서 닭이 부리로 모이를 쫏느라(쪼느라) 한창 부산했다. <장편소설 : 갑오농민전쟁>(조선말대사전)
*안마당에서 닭이 부리로 모이를 쫏느라(쪼느라) 한창 부산했다. <장편소설 : 갑오농민전쟁>(조선말대사전)
‘띠쫗다’는 ‘마구 쫏다(쪼다)’의 뜻으로 ‘뒤쫏다(뒤쪼으니, 뒤쪼아)’에 해당할 듯 한데 북의 사전에 ‘뒤쫏다’가 없다.
북의 『현대조선말사전』(1981)부터 ‘함부로 마구 쫏다(쪼다)’에 해당하는 말로 ‘짓쫏다(짓쪼으니, 짓쪼아)’를 올리고 예문으로 “벽에 머리를 짓쫏다.”를 보였다. 또 소설 문장에서 비슷한 용례를 볼 수 있다.
북의 『현대조선말사전』(1981)부터 ‘함부로 마구 쫏다(쪼다)’에 해당하는 말로 ‘짓쫏다(짓쪼으니, 짓쪼아)’를 올리고 예문으로 “벽에 머리를 짓쫏다.”를 보였다. 또 소설 문장에서 비슷한 용례를 볼 수 있다.
① *“시―작!” 하는 쨍쨍한 소리에 뒤미처 갈쿠리(갈고리)로 나무를 짓쫏는 것 같은 소리가 딱딱 울린다.
<김북향: 떠나는 날 밤>(북. 1959)
*그들은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바윗돌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굴껍데기를 짓쪼았다. <유주현: 6인공화국>
② *가슴이 텅 비고 괜히 서글퍼지면서 엉엉 소리내여(소리내어) 울고 싶었고 벽에다 머리를 짓쫏고 싶었고 살점을 마구 뜯어내고 싶었다. <허련순: 외로운 땅>(연변. 1998)
*나장을 시냇물에 차넣고 높은 놈의 상투를 잡아 채었다. (중략). 대갈통을 바위에 짓쪼아 시냇물에 휘젓다가 쳐들었다. <김성한: 이마> |주| 김성한(1919~)은 함남 풍산 출생임.
*그 바람에 옆에 있던 곽용배는 운전칸 천장에 머리를 짓쪼으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리기형: 수송길>(북. 1977)
*미모의 처녀 교원이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혔다. 그와 동시에 얼결에 덩달아 굽혀진 것도 최삼렬 교원의 허리였다. 하마트면(하마터면) 둘은 이마를 짓쪼을 번하였다. <리원길: 착각의 미감>(연변. 2000)
<김북향: 떠나는 날 밤>(북. 1959)
*그들은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바윗돌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굴껍데기를 짓쪼았다. <유주현: 6인공화국>
② *가슴이 텅 비고 괜히 서글퍼지면서 엉엉 소리내여(소리내어) 울고 싶었고 벽에다 머리를 짓쫏고 싶었고 살점을 마구 뜯어내고 싶었다. <허련순: 외로운 땅>(연변. 1998)
*나장을 시냇물에 차넣고 높은 놈의 상투를 잡아 채었다. (중략). 대갈통을 바위에 짓쪼아 시냇물에 휘젓다가 쳐들었다. <김성한: 이마> |주| 김성한(1919~)은 함남 풍산 출생임.
*그 바람에 옆에 있던 곽용배는 운전칸 천장에 머리를 짓쪼으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리기형: 수송길>(북. 1977)
*미모의 처녀 교원이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혔다. 그와 동시에 얼결에 덩달아 굽혀진 것도 최삼렬 교원의 허리였다. 하마트면(하마터면) 둘은 이마를 짓쪼을 번하였다. <리원길: 착각의 미감>(연변. 2000)
위 인용문 ①은 뾰족한 것으로 마구 쳐서 찍는 행동이며, ②는 머리, 이마를 ‘마구 또는 세게 찧거나 들이받는’ 행동으로 보인다. 북녘말 ‘쫏다’에 닭이 모이를 쪼아서 먹거나, 석공이 정으로 돌을 쪼는 행동 외에 ‘머리나 이마를 찧거나 들이받는’ 행동이 포함되는 듯 하다.
백석 시의 “부헝이(부엉이)가 담벽을 띠쫗고 죽었다”의 ‘띠쫗고’를 ‘짓쫏고=짓쪼고’로 보아 ‘마구 들이받고’에 해당하는 말로 볼 수 있겠다. 평안도 지역어에 ‘지다’를 ‘디다’, ‘찌다’를 ‘띠다’로 말하는 것이 있다.
백석 시의 “부헝이(부엉이)가 담벽을 띠쫗고 죽었다”의 ‘띠쫗고’를 ‘짓쫏고=짓쪼고’로 보아 ‘마구 들이받고’에 해당하는 말로 볼 수 있겠다. 평안도 지역어에 ‘지다’를 ‘디다’, ‘찌다’를 ‘띠다’로 말하는 것이 있다.
가난이 / 갔겄다
旌門집 가난이는 열다섯에
늙은 말군한데 시집을 갔겄다
‘가난이’를 송준(1995)은 ‘맏딸을 지칭하는 말’이라 했다. 혹 ‘가난한 이’로 생각하는 이도 있겠다. 그러나 이 ‘가난이’는 지난날의 여자 이름의 한 가지인 ‘간난이/갓난이’와 같은 말로 보인다. 소설에서 몇 문장을 인용해 본다.
*잡혀갔던 동리 사나이는 무사 백방이 되어 나와서 간난이와 혼인을 하고 간난이 병도 가을 하늘같이 말갛게 낫고, … <송영: 아버지>(동아출판사. 1995/1936)
*이틀 후에 인천으로 내려온 간난이와 선비는 우선 간난이가 공장에서 사귄 어떤 동무 집에서 유하게 되었다. <강경애: 인간문제>
*이번에는 올해 일곱 살밖에 아니 된 갓난이란 계집애가, 반은 선생에게 떠다밀려서 무대 한복판으로 나왔다. <심훈: 상록수>
*손녀가 태어났을 때 홍씨는 손자가 아닌 게 섭섭해 영감에게 이름을 지어달란 부탁도 안 하고 제멋대로 갓난이라고 불렀었다. <박완서: 미망>
*이틀 후에 인천으로 내려온 간난이와 선비는 우선 간난이가 공장에서 사귄 어떤 동무 집에서 유하게 되었다. <강경애: 인간문제>
*이번에는 올해 일곱 살밖에 아니 된 갓난이란 계집애가, 반은 선생에게 떠다밀려서 무대 한복판으로 나왔다. <심훈: 상록수>
*손녀가 태어났을 때 홍씨는 손자가 아닌 게 섭섭해 영감에게 이름을 지어달란 부탁도 안 하고 제멋대로 갓난이라고 불렀었다. <박완서: 미망>
‘시집을 갔겄다’의 ‘갔겄다’는 ‘갔것다’로 적어야 바를 듯 하다. ‘-것다’는 미루어서 인정하거나 확인함을 나타내는 예스러운 표현에 쓰이는 맺음끝(종결어미)이다. 이 시의 화자는 열다섯 살 가난이가 가엾게도 늙은 말꾼한테 시집간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것다’는 '추측', ‘의지’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겠다’와는 차이가 있다. 비슷하게 쓰이는 ‘-렷다’도
‘-렸다’가 아니다. 몇 예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것다’는 '추측', ‘의지’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겠다’와는 차이가 있다. 비슷하게 쓰이는 ‘-렷다’도
‘-렸다’가 아니다. 몇 예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너, 정말 그랬것다. *틀림없는 그 사람이것다.
*어사또가 춘향 모를 속여 부르는디(는데), 꼭 이렇게 부르것다. “이로너라(이리 오너라), 이로너라, 게 아무도 없느냐?” <정정렬 판: 춘향가>
*옷이 좀 크렷다. *사실이 그러하렷다.
*머지안허(머지 않아) 겨울은 또 오렷다. <김유정: 만무방>.
*단풍때라 한참 좋으렷다! <염상섭: 이심>
*신작로로 나서 필연코 강릉이나 서울로 갔으렷다! <이효석: 산협>
*어사또가 춘향 모를 속여 부르는디(는데), 꼭 이렇게 부르것다. “이로너라(이리 오너라), 이로너라, 게 아무도 없느냐?” <정정렬 판: 춘향가>
*옷이 좀 크렷다. *사실이 그러하렷다.
*머지안허(머지 않아) 겨울은 또 오렷다. <김유정: 만무방>.
*단풍때라 한참 좋으렷다! <염상섭: 이심>
*신작로로 나서 필연코 강릉이나 서울로 갔으렷다! <이효석: 산협>
(다음에 계속)